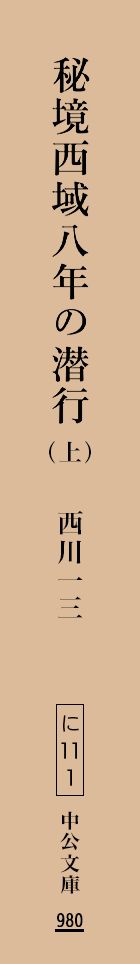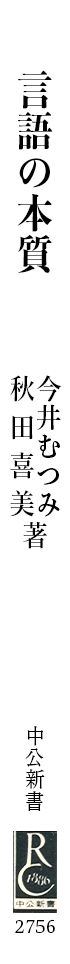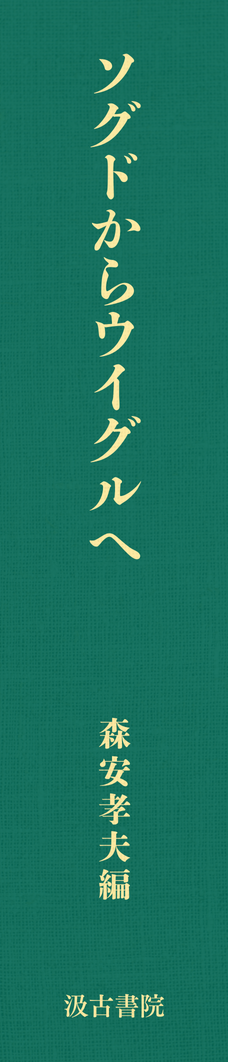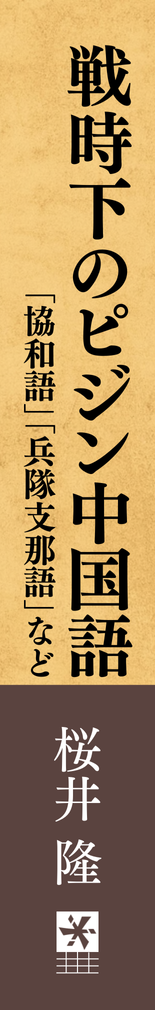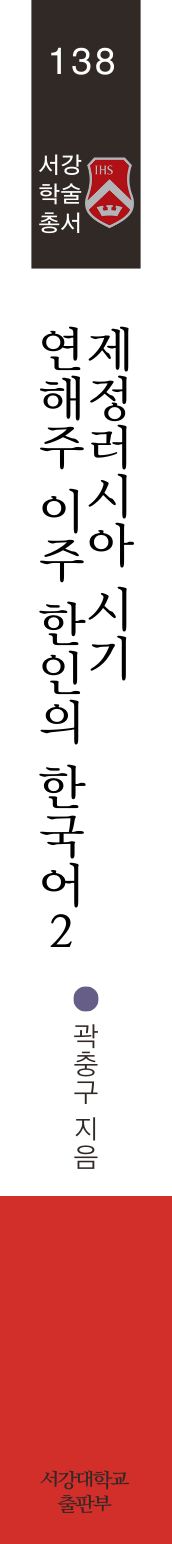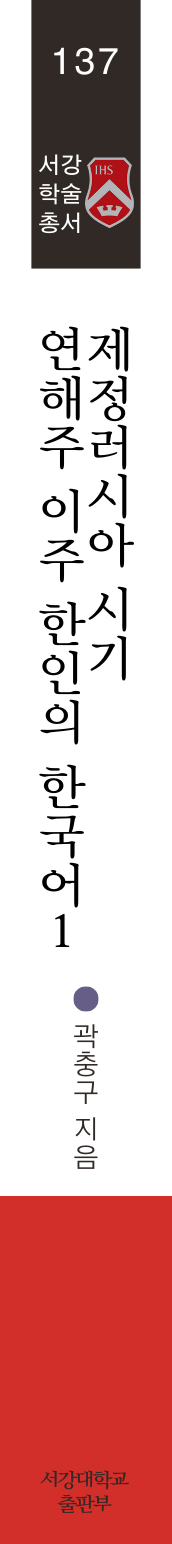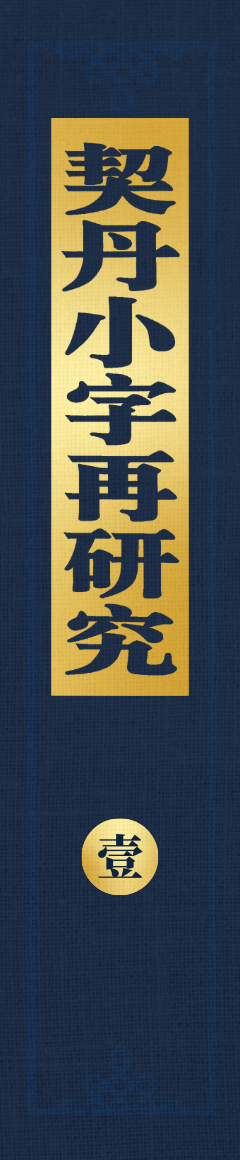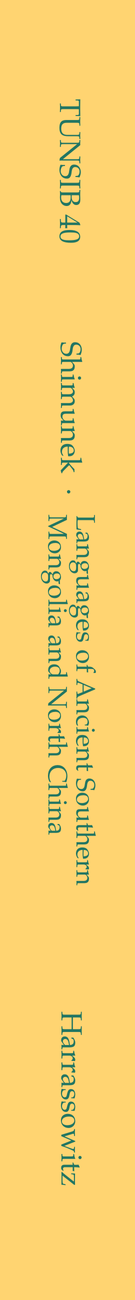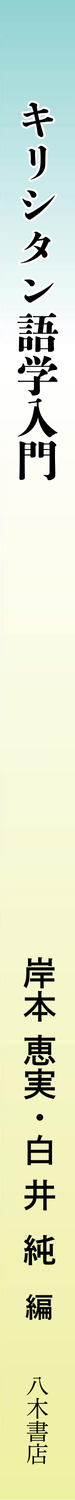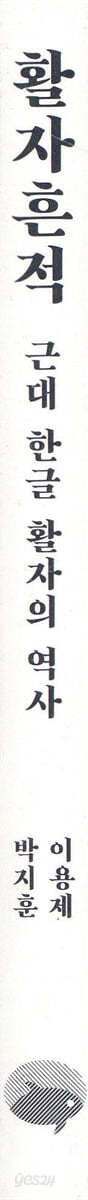일본 {敦煌學|돈황학}의 거인 {吉田豊|요시다 유타카}는 그의 저서마다 {石田幹之助|이시다 미키노스케}의 명저 『{長安の春|장안의 봄}』에 소개된 {唐詩|당시} 한 구절을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吉田|요시다}가 특히 찬탄하여 마지않는 {詩仙|시선} {李白|이백}의 작품인 「{當壚胡姬|당로호희}」는 {唐代|당대} {長安|장안}의 술집에서 손님에게 시중드는 이란계 창녀인 {胡姬|호희}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으로, 소그드 연구에 일평생을 바친 그에게 있어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胡姬貌如花|호희의 자태 꽃다워}
{當壚笑春風|술청에 앉아 봄바람에 미소짓네}
{笑春風舞羅衣|봄바람에 미소짓고 비단옷(시스루) 걸치고 춤추는데}
{君今不醉將安歸|그대 지금 취하지 않고 어디 가려 하는가}
이 문장은 중화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적 위업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되는 {唐代|당대}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多元的|다원적} 사회의 일면을 공상하는 재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문명의 충돌과 변용에 강렬한 흥미를 품어왔던 나는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 혹은 초원·오아시스를 테마로 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왔다. 작년 겨울에 {中共|중공}이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15일 이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면서 중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후보지로 {呼和浩特|후흐호트}, {蘭州|란저우}, {敦煌|둔황}, {烏魯木齊|우룸치} 등지를 고려하였으나, 실크로드 기행의 초행길로서 가장 적합한 곳은 역시나 {西安|시안}으로 귀결되었다. 내게 있어 {西安|시안}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지금의 {西安市|시안시} 일대와 그 주변은 일찍이 {先秦|선진} 시기부터 {五代|오대} 이전까지 수많은 왕조의 도읍지로서 기능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실크로드의 기점 도시로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隋|수}·{唐|당} 시기의 {長安|장안}을 떠올린다. 북쪽으로는 {黃河|황하}의 지류인 {渭水|위수}가 흐르고, 그 {北岸|북안}은 {中華|중화} 최초의 통일 제국인 {秦代|진대}의 {咸陽|함양}이 있던 곳이다. {西安|시안}이 갖는 문화적 깊이와 역사적 함의는 실로 방대하여 {一擧一擧|일거일거}의 나열을 {不許|불허}한다.
한국인에 대한 {中共|중공}의 사증 면제 조치와 {西安|시안}의 무궁한 관광 자원에도 불구하고, 왕복 약 3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席|석}을 예약할 수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中共|중공}의 노력이 무색하게, 현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한국인이 그나마 즐겨찾는 곳은 {北京|베이징}·{上海|상하이} 정도이다. 발상을 전환시켜보면, 중국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거든 지금이야말로 {適期|적기}이다. 나는 당초에 혼잡을 피하고자 중국에서 {春節|춘절} 연휴가 끝난 {立春|입춘} 기간에 {西安|시안}을 4박5일 일정으로 방문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야말로 「{長安|장안}의 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문화를 주제로 삼는 만큼 부득불 {漢字|한자}를 {多用|다용}하게 됨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다만 {仁|인}의 {一端|일단}인 {惻隱之心|측은지심}을 구사하여, 한국어 화자이면서 {漢盲|한맹}인 이들을 배려한 루비를 쳐두었으니 글을 읽어나감에 있어 적어도 피상적으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동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OZ347편에 탑승하여 10시 10분 (UTC+9)에 이륙, 약 3시간 20분간 비행한 뒤 12시 23분 (UTC+8)에 {西安咸陽|시안·셴양}국제공항 제3터미널에 착륙하였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한 시간의 시차가 있어, 서쪽으로 비행한 나는 한 시간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 이 글에서 사용되는 시간은 중국표준시(UTC+8)이다. 점심식사는 기내식으로 때웠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은 뒤, 택시를 탈까 고민하다가 공항과 연계된 지하철을 이용해보기로 하였다. 중국의 바깥 공기를 아직 마셔보지 못한채 지하로 내려가 시안 지하철 14호선 {機場西|공항 서}(T1, T2, T3)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시안 지하철의 승강장과 열차 내에는 {陝西省|산시성}의 고급 {白酒|백주} 브랜드인 {紅西鳳|훙시펑}의 광고가 도배되어 있었다.


열차는 {機場西|공항 서}(T1, T2, T3)역에서 출발하여 다음 역인 {機場|공항}(T5)역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이 역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정차하였는데, 처음에는 유리 재질의 밀폐형 스크린도어를 보호하기 위해 예컨대 GTX-A 노선의 미개통 역을 통과할 때처럼 잠시 감속하는 줄 알았으나, 정차 후 출입문까지 열리는 것이었다. 정차 전, 미개통 역인 {機場|공항}(T5)역에 하차하면 위험하니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져 차내에 머물러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운행 방식이라 중국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시안 지하철의 디스플레이 시인성은 매우 우수하여 승객의 지하철 이용 경험을 지탱해주고 있다. 열차가 달리는 내내 다음 정차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번갈아 제시한다. 서울 지하철의 디스플레이 운용 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시안 지하철의 시스템을 높게 사고 싶다.


열차는 지상으로 빠져나와 {空港新城|쿵강신청}역에 정차했다. 이곳은 새로 건설 중인 신도시로 보이는데, 공항에서 보았던 {空港大酒店|공항 호텔}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공항」을 의미하는 {機場|기장=지창} 대신에 특수한 {空港|공항=쿵강}이 사용되었다. {空港|공항}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어휘인만큼, 중국에서 이것이 쓰이는 맥락이 궁금해졌다. 마치 인천공항 근처 시설을 명명할 때 「에어」 또는 「스카이」를 즐겨 쓰거나, 일본의 공항 연락 철도에서 보이는 「에어포트 라이너」처럼 외래어를 써서 멋을 낸 느낌일까?
{空港新城|쿵강신청}역부터 한동안은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지, 아직 외장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즐비한 콘크리트 건물군이 차창 너머로 나타났다. 외장 없이 벌거벗은 건물의 수가 사진으로 담을 수 없을만큼 워낙 많고 건설 노동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보니, 또한 {恒大|헝다} 그룹과 {碧桂園|비구이위안}으로 불거진 중국 부동산 위기 관련 뉴스를 주로 접해왔기에, 건물 수십 채의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레짐작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百度|바이두} 커뮤니티에 검색해보니, 현재 공사 진도가 아주 빠르며, 중국 건설 업계에서 경쟁력 5위를 차지한 {某|모} 건설그룹 본부도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秦宮|친궁}역, {渭河南|웨이허난}역 등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지명의 역을 지나 {西安北站|시안베이잔}역에서 하차하여 시안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하였다. 철도 강국인 중국답게 열차의 만듦새와 승차감은 뛰어났다. 특히 2호선과 14호선의 신형 차량은 주행 시의 진동이 적고 쾌적한 차내 경험을 가능케 했다. 5일차에 2호선에서 탑승한 구형 차량의 불규칙적이고 불안한 굉음은 직선 구간에서조차 거슬리게 느껴졌는데(서울 2기 지하철에서 특히 소음이 심한 구간을 연상시키는 수준), 이를 통해 신형 차량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사실을 역체감할 수 있었다.
궤도 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달려 13시경에 {鐘樓|중러우}역에서 하차했다. 역 지하 구내에는 시안 지하철 6호선 2기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元|원}·{淸|청} {兩代|양대}의 {古井遺址|옛 우물 터}가 유리벽을 두고 전시되어 있었다. 과연, {千年古都|천년고도}의 이름값을 하듯 지하철 공사 중에 고적이 발견되는 클리셰는 이곳에서도 벌어졌던 것이다. 우물을 둘러보며, 작년 겨울에 그리스에서 지하철 공사 중에 로마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를 역 구내에 보존하기로 하였다는 뉴스를 떠올렸다. 역사 깊은 도시일수록, 문화재의 가치 보전과 효율적인 도시 개발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현실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鐘樓|중러우}역에는 {唐長安|당 장안}을 배경으로 한 {唐詩|당시}를 소개하는 촬영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중국인의 시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기에, 번화가에는 유명한 {詩句|시구}를 네온으로 만들어서 세로로 주렁주렁 매달아놓는 장식이 유행하고 있다. {鐘樓|중러우}역에 전시된 {唐詩|당시} 한 수 일부를 여기에 옮긴다.

{岑|잠}{參|삼}「{與高適薛據登慈恩寺浮圖|고적·설거와 함께 자은사 부도에 오르다}」
{塔|탑}{勢|세}{如|여}{湧|용}{出|출} {孤|고}{高|고}{聳|용}{天|천}{宮|궁}
{登|등}{臨|림}{出|출}{世|세}{界|계} {磴|등}{道|도}{盤|반}{虛|허}{空|공}
{突|돌}{兀|올}{壓|압}{神|신}{州|주} {崢|쟁}{嶸|영}{如|여}{鬼|귀}{工|공}
{四|사}{角|각}{礙|애}{白|백}{日|일} {七|칠}{層|층}{摩|마}{蒼|창}{穹|궁}
여기서 언급되는 {慈恩寺|자은사} {浮圖|부도=불탑}란 유명한 {大慈恩寺|대자은사} 소재의 {大雁塔|대안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2일차에 방문하여 직접 올라간 곳이다.
길고 고된 이동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와 드디어 시안의 {陽光|양광}을 목도한 때는 15시 13분. 거리의 번화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래간만에 대륙의 기상을 만끽하였다. 다행히도 공기질은 양호한 편이었다. 길거리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漢服|한푸}를 입은 여성 관광객이 많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관광 테마인 것으로 보인다. 신기하게도 {韓中日|한중일}의 역사 관광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전통 의상을 대여해 입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 장례식이나 정치권의 공적인 {饗應|향응} 자리(주로 일본)에서 전통 의상을 입는 것도 주로 여성이다. 전통 의복이 주로 여성에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시대가 다르기는 하나 {唐代|당대} 소그드인의 경우 전통 의복을 유지한 것이 남성이었다는 반례가 존재한다.
15시 반경에 {碑林區|베이린구} {騾馬市|뤄마스} 상업거리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하였다. 체크인 도중에 어떤 남성이 끼어들어서 객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자, 카운터 직원은 이 시기의 산시성은 아주 건조하여 에어컨을 트는 대신에 중앙난방 형태의 {暖氣|놘치}를 넣는다고 응대하였다. 실제로 내가 묵은 객실에서도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방에 온기가 돌았다. 시안이 아주 건조한 것도 사실이었다. 2일차에 내 입술은 완전히 갈라져서 백주를 들이키자 입술에 타들어가는 작열감이 들었고, 4일차부터는 휴지로 입을 닦기만 하여도 피가 묻어나올 지경까지 되었다. 시안의 겨울이 이 정도로 건조할 줄은 예상밖이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
종루
호텔에서 개인정비 시간을 가졌다. 텔레비전을 틀고 2025 {哈爾濱|할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중계를 시청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선두의 성적을 거두었고, 한국과 일본은 뒤를 이어 각각 2–3위를 점했다.
16시 50분경에 호텔을 나와 {西安鐘樓|시안 종루}를 향했다. {鐘樓|종루}는 지하 통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4일차에 성벽 위로 올라갈 때도 지하 통로를 통해 짐 검사를 받았는데,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적은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지하를 통해 인원을 통제하고 우선적으로 보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같았다. 입장권은 2차원 코드를 스캔하여 {微信|위챗}으로 구입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나처럼 중국 내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인증이 불가능하여 {有人|유인} 매표소를 이용해야 했다. 관광객이 많아 각자 여권을 제시한 뒤 결제를 진행하기까지 2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 경비원에게 표를 보여주고 짐을 검사한 다음 지하 통로를 거쳐 비로소 {鐘樓|종루}로 올라갈 수 있었다.

내부에는 {鐘樓|종루} 관련 유물과 내력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본래 {明太祖|명 태조} {洪武帝|홍무제} 연간인 1384년에 건설된 누각으로, 원래는 현재 위치에서 북서쪽 방면으로 1km 가까이 떨어진 {廣濟街|광제가}에 놓여 {西安鼓樓|시안 고루}와 마주보고 있었으나, {明|명} {萬曆帝|만력제} 연간인 1582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이처럼 대형 건축을 통째로 옮기는 공사는 세계 건축사에서도 희귀하다고 한다. {鐘樓|종루} 이전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陝西|섬서} {監察御史|감찰어사}였던 {龔懋賢|공무현}으로, {鐘樓|종루} 내에 전시된 1582년{作|작} 「{鐘樓東遷歌|종루동천가}」를 지은 이이기도 하다. {淸代|청대}에 세 차례의 대대적인 중수 작업이 있었으나 1939년에 일본군의 공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다섯 차례의 보수 작업을 통해 1984년이 되어서야 일반공개되었다.
종루 내에는 총 3개의 비석이 존재한다. 방금 언급한 「{鐘樓東遷歌|종루동천가}」, 1740년에 대규모 개수한 뒤 지은 「{重修西安鐘樓記|중수서안종루기}」, 나머지 하나는 1953년에 {中共|중공} 인민정부가 세운 것이다.

{羌玆樓兮誰厥詒|아, 이 누각은 누가 남긴 것인가!}
{來東方兮應昌期|동방으로 옮겨와 창성기에 응하는구나}
{挹終南兮雲爲低|종남산을 우러르니 구름도 낮아보이고}
{憑清渭兮銜朝曦|맑은 위수에 기대어 아침 햇살을 머금네}
{鳴景雲兮萬籟齊|경운종이 울리니 온갖 소리가 어우러지고}
{彰木德兮奠四隅|목덕을 드러내 사방을 굳건히 받치니}
{千百億祀兮鍾虞不移|긴 세월이 지나도 이 종은 흔들림 없으리}
「{重修西安鐘樓記|중수서안종루기}」의 내용은 이 글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언급되는 {景雲鐘|경운종}은 1950년대에 {碑林|비림}으로 이설되어 현재도 전시되고 있다.
최상층에 오르고서는 성벽의 남문에 해당하는 {永寧門|영녕문}으로 이어진 {南大街|난다제} 방면을 바라보았다. {鐘樓|종루}는 주위에 회전교차로를 두르고 있고 사방으로 널찍한 도로가 길게 뻗쳐 있어 장관을 이룬다. 이러한 방사형 도시 구획은 대륙의 여유로운 공간 활용과 맞물려 시원한 개방감을 준다. {霧霾|미세먼지}가 잔잔하게 낀 대기는 멀리 있는 피사체일수록 윤곽을 부옇게 보이도록 하여 {遠近|원근}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 교내 사진부 인턴십으로 들어온 내게 카메라의 노출 3요소를 지도해준 필리핀{人|인} 포토그래퍼는, 중국에서 공기질이 적당히 좋지 않을 때면 빛을 주제로 한 예술 사진을 촬영하기에 좋다고 알려주었다. 이 날은 빛이 번질 정도로 충분한 {霧霾|미세먼지}가 끼지는 않았다.

종루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도 좋지만, 해가 저물고 멀찍이 떨어진 데서 종루를 바라볼 때의 광경이 나는 더 좋았다. 중국은 어느 도시를 가도 야경을 염두에 둔 광원 설계가 인상적인데, 특히 전통 건축의 경우 은은한 채도의 색이 들어간 빛을 쏘아 올려 반사광을 조성하고 기와 마루에 LED등을 켜서 지붕의 윤곽을 강조한다. 유약을 바른 비취색의 기왓장은 시안의 랜드마크로 솟은 {鐘樓|종루}의 우아함을 가일층 돋보인다.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청기와의 빛깔이다.
회민가
{鐘樓|종루}에서 내려와 서쪽으로 이어진 지하 통로로 들어가자 길게 늘어선 잡화상이 나타났다. 한자를 주제로 한 잡동사니를 발견하여 구경하던 중, 무시무시한 글자를 쓰는 {𰻞𰻞麵|뱡뱡몐}의 발상지인만큼 {𰻞|뱡}{字|자} 자석이 있으면 구입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저들 기이한 글자는 재물운을 기원하는 문구의 {合字|합자}로, 「{日進斗金|일진두금}」과 「{招財進寶|초재진보}」의 {合字|합자}는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合字|합자}는 무슨 글자의 조합인지 판별하지 못하였다.

지하 통로를 빠져나오자 과거에 {鐘樓|종루}와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鼓樓|고루}가 나타났다. {鼓樓|고루}에는 오르지 않고 우회하여 나가자 시끌벅적한 번화가에 다다랐다. 현지인들은 {坊上|방상} 혹은 {回坊|회방}이라고 부르는 곳이지만, 일반적으로 외지 관광객들에 의한 통칭은 {回民街|회민가}, 즉 「회족 거리」이다. 대로 근처에 중국 내 전통 이슬람 사원인 {淸眞寺|청진사}들이 산재해 있다. 대로 이외에는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 체증이 빈발한다. 이곳은 다양한 할랄 식품이 판매되는 미식 문화 거리로 유명하지만, 관광지화가 너무 진행된 탓에 바가지가 심한 것으로 악명 높다. 나는 {回民街|회민가}에서 {陝西|산시} 명물 {肉夾饃|러우자모}를 15元에 구입하여 손에 들고 거리를 구경했다. 간혹 황당하게도 햄버거의 기원(!)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는 식품이다.

{唐代|당대}에 이미 무슬림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長安|장안}에 들어왔으며, {五代|오대}부터 {北宋|북송} 연간에 {化覺巷|화각항} 청진대사, {大學習巷|대학습항} 청진사 부근에 회족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明代|명대}에는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이 지역의 {回族化|회족화}가 더욱 진행되었고, {淸|청} {乾隆帝|건륭제} 이전에는 일곱 곳의 청진사를 열세 군데 {商街|상가}의 주민들이 관할하였기에 {七寺十三坊|칠사 십삼방}이라고 불렸다.

{淸|청} {同治|동치} 연간(1862–1874)에 {陝西省|산시성}과 {甘肅省|간쑤성}에서 일어난 회족 반란, 즉 {陝甘回亂|섬감회란} 이 발생했으나, 회민가의 회족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淸末|청말}의 혼란을 틈 타 발발한 봉기에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봉기에 참여하였으나, 청나라 군대에 진압당하고 무슬림 공동체의 인구수는 70만여명에서 2만여명으로 급감하였다. {民國|민국} 시기에는 이흐와니 사상이 전파되면서 새로 {灑金橋|쇄금교} {淸眞西寺|청진서사}와 {小學習巷|소학습항} {淸眞中寺|청진중사}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營里寺|영리사}와 {大學習巷|소학습항} {淸眞寺|청진사}도 이흐와니를 수용하였다. 이흐와니는 19세기 중국에서 탄생한 수니{派|파} 하나피{學派|학파}에 속하는 이슬람의 일파로, 창시자인 {馬萬福|마만복}은 어릴 적부터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공부하였으며, 1888년에는 {新疆|신장}을 경유하여 {하지|성지순례}를 수행했고, 당시 아랍{半島|반도}에서 유행했던 와하브{派|파}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이슬람 개혁을 추진했다.
이로써 회방에는 아홉 곳의 사원이 존재하게 되었으나, {中共|중공} 성립 이후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체의 종교 활동이 금지되면서, 극소수의 사원만이 장례 등의 제한적인 용도에 한해 개방되기에 이른다. 이후 1982년이 되어서야 법령에 따라 다시 개방되었으며, 세 곳의 사원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열두 사원이 존재한다고 한다. 나는 대로를 빠져나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잡동사니들을 구경하였다.

화각항 청진대사
앞서 언급한 유서 깊은 일곱 곳의 {淸眞寺|청진사}를 모두 둘러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하여,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중요한 {化覺巷|화각항} {淸眞大寺|청진대사}를 다녀왔다. 좁은 상점가를 구불구불 지나가면 아름다운 아랍문자 서예가 석각된 {照壁|조벽}이 나타난다. 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한 초저녁 무렵이었다.

{淸眞大寺|청진대사}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로, 742년 {唐|당} {玄宗|현종} 연간에 창건되었다. 현존하는 주요 건축물은 {明|명} {洪武帝|홍무제} 연간(1392년)부터 1522년까지 지어진 {明朝|명조} 건축 양식이며, 이후 1606년과 1764–68년에 수 차례 개축이 진행되었다. 부지가 동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메카를 향해 {遙拜|요배}하기 위해 건물 전체가 {東向|동향}으로 지어진 탓이다(절하는 방향이 서쪽이므로).
당대 이래 중국에 스며든 이슬람 사원은 건축학적으로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각각 중앙아시아 양식, 과도기적 양식, 토착화 양식, {新疆|신장} 지구 양식이다. 내가 방문한 {化覺巷|화각항} {淸眞大寺|청진대사}는 토착화 양식의 대표격인 이슬람 사원으로, 시안에 현존하는 열네 곳의 청진사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크다. 건축사적으로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사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唐|당} {天寶|천보} 연간(742년)에 창건되었으나 {唐|당} 멸망과 함께 폐허가 되었고, 이후 수 차례의 개수가 진행되어 {明淸代|명·청대}에 들어 {西安|시안} 일대가 재건되면서 함께 부흥했다. 건물군은 다섯 개의 {中庭|중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원에는 대문과 {牌樓|패루}, 제2원에는 {南宋|남송} 시대의 예배당인 {勅修賜殿|칙수사전}이 있다. 제3원에는 중층 지붕으로 된 팔각탑인 {省心樓|성심루} 또는 {邦克樓|배극루}라고 불리는 미나레트(예배 시간을 공지하는 탑)가 있고, 그 측면에는 목욕을 위한 욕실과 응접실 등이 마련되었다. {三連門|삼연문}을 넘으면 나오는 제4원에는 {鳳凰亭|봉황정}과 {碑廊|비랑}이 있고, 가장 깊은 제5원의 중심에는 예배전이 있으며 {前廊|전랑}, 예배전당, {後窰殿|후요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後窰殿|후요전}에는 민바르(설교단)와 미흐라브(키블라 벽에 움푹 들어간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예배전 바닥에는 페르시아 융단이 깔려 있으나, 아랍 문자 캘리그라피 장식을 제외하면 건축 양식은 거의 중국 전통 건축을 따르며, 모스크의 상징인 돔은 없다.
제1원

매표소에서 {冬季|동계} 한정 가격인 15元에 입장권을 교환했다. 겨울 이외의 시기에 구입할 경우 가격은 25元이다. 들어서면 {勅賜禮拜寺|칙사 예배사}라고 적힌 나무 {牌坊|패방}이 시야에 들어온다. 패방은 {淸代|청대}에 세워진 것이다. 나는 북쪽 입구를 통해 원내에 들어왔으므로, 나무 패방 아래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제1원과 제2원 사이에 놓인 관문인 {五間樓|오간루}를 향했다. 다분히 동양{風|풍}의 모티프가 포함된 석각 예술이 벽면에 박힌 {五間樓|오간루}에는, 아랍{文字|문자}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마치 한자의 {金文|금문}을 연상시키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독특한 서예 양식으로 적힌 {柱聯|주련}이 걸려 있다. 각각의 {字素|자소}를 판독하는 작업조차 버거우므로, 여기서 {柱聯|주련}에 적힌 문구의 의미를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淸眞大寺|청진대사}의 아랍{文|문} 명문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해보아도, 그 대부분은 예배전 내부의 명문을 중심으로 취급하며, 기타 사소하지만 일반 관광객이 주로 보게 되는 명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주지 않는다.
제2원
이어서 제2원의 정중앙에 위치한 돌 패방을 통과하였다. 돌 패방에는 아마도 {聖|성} 쿠르안의 구절을 인용해왔을 아랍어 {銘文|명문}이 새겨져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내 지식으로는 판독이 어렵다.


제2원을 다 보았을 즈음에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본래대로면 {省心樓|성심루}에서 종소리가 울려나와야 하겠지만, 지금은 스피커를 사용하여 종소리를 증폭시켜 재생하는 것으로 보였다. 종소리가 멎은 뒤에는 「아잔」 혹은 「이카마」로 추정되는 구절이 낭독되었다. 방송 언어는 아마도 아랍어일 터임에도 중국어의 특징적인 권설 접근음이 부각되어 들렸다.
제2원에서 나의 가장 큰 흥미를 끈 건축은 돌 패방과 {勅修賜殿|칙수사전} 사이에 남북으로 놓인 두 {基|기}의 {衝天碑|충천비}이다. 토착화된 건축 양식 속에서도 유독 동서 문명의 절충이 엿보이는 이 {石碑|석비} 쌍은 {淸眞大寺|청진대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축이라는 데서 나와 일행의 의견이 일치하였는데, 아무래도 벽돌과 기이한 문양을 활용한 것이 여타 건축과 구분되는 {西域|서역}의 감각을 두드러지게 보여줬기 때문이리라. 이와 같은 {東洋古都|동양 고도} 속의 이질적 존재는 그야말로 고대 문명의 충돌과 변용을 찾아 길을 나선 우리가 기대했던 실크로드의 {所産|소산}이며, {淸眞大寺|청진대사}는 이번 여행의 첫 일정을 마무리짓기에 실로 합당한 고적이었다.

{衝天碑|충천비} 를 양 어깨에 끼고 나아가면 {勅修賜殿|칙수사전}으로 이어진다. 이곳은 {南宋代|남송대}의 예배당으로, 내부에는 악명 높은 {西太后|서태후}가 {義和團|의화단} 사변 때 피신하여 {西安|시안}에 머물던 당시에 친히 지은 「{派衍天方|파연천방}」 편액이 걸려 있고, 북측에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중국어로 새겨진 3기의 비석이 놓여 있다. 이들은 이 이슬람 사원의 오랜 역사와 내력을 알려주지만, 가장 동쪽에 놓인 페르시아어 비석은 마모가 심각하여 육안으로는 도저히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반면 이 공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비석일 터인 통칭 「{淸眞月碑|청진월비}」는 빼곡하게 {左|좌}로 기울여 적은 아랍{文|문} 글씨가 인상적이며, 해당 언어에 익숙하다면 적어도 상반부는 충분히 {目視|목시}로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남아 있다. {淸|청} {雍正|옹정} 연간(1733년) 당시에 {小西寧|소서녕}이라고 불리운 {阿訇|아훈드=이맘}에 의해 새겨진 「{月碑|월비}」는 {禁食月|라마단} 시기를 계산하는 {曆法|역법}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해당 비석의 중국어 발췌역을 이 글에 전자화해두었다.
{勅修賜殿|칙수사전}의 좌우로 놓인 {垂花門|수화문}에는 무슬림의 단결과 메카를 향한 성지순례에 관한 아랍어 명문이 걸려 있다.
{واعتصموا بحبل الله جميعا ولا تفرقوا|모두가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잡으라 그리고 분열하지 말라} (이므란:103)
{وعلى الناس حج البيت لمن استطاع إليه سبيلا|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노라} (이므란:97)
제3원
{勅修賜殿|칙수사전}을 서쪽으로 나오면 제3원에 진입한다. 시야에는 팔방으로 솟구친 추녀마루가 인상적인 {省心樓|성심루}가 가장 먼저 들어온다. 기와는 유약을 발라 윤기가 도는 청기와를 얹어 절제된 화려함 뽐낸다. {省心樓|성심루}는 이슬람 사원의 필수 요소인 미나레트인데, 본래는 예배 시간을 공지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루에 다섯 차례 기도해야 하는 회교도들에게 정확한 예배 시간을 숙지하도록 하는 아잔과 이카마는 미나레트에서 울려퍼진다. 내가 읽은 몇 가지 기행문에 따르면, 이곳에는 {省心樓|성심루} 외에도 소형 미나레트가 존재하지만, 모두 이슬람 사원에서 기대되는 돔은 갖추지 않았으며, {省心樓|성심루}의 규모가 가장 크며 사원의 최중심에 존재한다.

{省心樓|성심루} 안에 들어가니 이슬람 문화권의 모티프가 포함된 석각 예술이 마름모꼴 격자 무늬로 구성된 벽면에 양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관람객은 상층부로 올라갈 수 없지만, 목재로 마감된 1층 천장을 유심히 보면 사다리를 젖혀서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省心樓|성심루}의 남측에는 손님을 맞는 {會客廳|회객청}과 예배에 임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욕실이 있다. 그러나 이미 해가 저문 늦은 때라 나는 시간에 쫓겨 중앙 {順路|순로}를 위주로 관람하기로 하였다. 제4원으로 이어지는 {連三門|연삼문}을 통과한 무렵에는 석양에 비치는 어스름한 잔영에 겨우 의지하여 사원 내부를 관람하게 되었다.
제4원
제4원은 {淸眞大寺|청진대사}에서 가장 작은 {中庭|중정}이다. {鳳凰亭|봉황정}에는 「{一眞|하나의 진리}」라는 짧지만 핵심을 꿰뚫는 문구가 적힌 편액이 내걸려 있다. {勅修賜殿|칙수사전}에서 보았던 {西太后|서태후}와 {光緖帝|광서제}의 {親題|친제} 편액보다 나는 {一眞|일진}이 간결하게 적힌 {鳳凰亭|봉황정}의 편액이 마음에 들었다. {鳳凰亭|봉황정}의 좌우 건축은 보수 공사 중이었다. 남측에는 진귀한 비석들이 전시된 {碑廊|비랑}이 있으나, 나는 관람하지 못하였다.


회교의 맥락에서 유일신 「알라」는 {眞主|진주}라고 칭해지는데, {一眞|일진}은 이슬람교의 일신교적 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두 글자인 것이다.
제5원
{淸眞大寺|청진대사}의 최심부에 위치한 제5원은 {月臺|월대}와 예배전으로 구성된다. 이미 캄캄해진 하늘 아래 {月臺|월대} 위에 서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예배전을 바라보았다. 중앙에는 바스말라 구절 「{﷽|자비롭고 자애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독특한 서예 양식으로 묘사된 거대한 편액이 내걸려 있고, 그 양옆으로 「{爲善最樂|위선최락}」「{惟精惟一|유정유일}」 편액이 걸려 있다. 기둥마다에는 독특한 마름모꼴로 교묘하게 적힌 아랍문자 서예 {柱聯|주련}이 달려 있다.

예배전 내부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신성한 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예배전 내부의 건축 예술과 서예 양식을 감상하고 싶었으나, 이곳의 주민도 아니거니와 {非信徒|비신도} 문외한에 불과한 내가 신성한 기도가 자아낸 엄숙한 분위기를 차마 깰 수 없는 법인지라, 진입을 단념하고 바깥에서 회교도가 기도하는 모습을 조심스레 훔쳐보는 것에 그쳤다. 외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내부의 예배 상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배려 덕분에 내부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실시간 모니터 영상을 통해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絨|융}과 Dilmi (2014)에서 설명되는 알라의 99가지 이름을 기둥마다 13가지씩 마름모꼴로 기록한 {柱聯|주련}을 확인하였다.

예배가 끝난 뒤 예배전에서 나온 회교도들과 함께 나는 사원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해가 저문 뒤에는 광량이 부족하여 사진 촬영이 곤란해졌고, 또한 중앙 {順路|순로}에서 떨어진 다른 건물은 근처에 가보지 못하였다. 대신에, 나오는 길에는 중앙에서 벗어나 103번째 수라의 구절인 {وتواصوا بالحق|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권고하며} wa-tawāṣaw bi-l-ḥaqqi라고 적힌 문을 통과해보았다.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생애 처음으로 모스크를 방문하여 이슬람교에 대한 호기심을 얻은 나는, 이번에 보지 못한 사원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방문을 기약하기로 하고 {回民街|회민가} 방면으로 돌아왔다.
저녁식사
{回民街|회민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지만, 상당히 지친 나머지 호텔에 돌아가지 않고 {回民街|회민가}에서 저녁식사를 해치우기로 하였다. 대로는 너무 붐비기 때문에 인적이 적은 곳을 찾아 들어가 {𰻞𰻞麵|뱡뱡몐}을 주문하고 몇 가지 {涼菜|량차이}를 골라 담았다. 예상한대로 {西安|시안}의 물가 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었지만, 한국의 외식 물가에 익숙해진 내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음식은 먹을 만했으나 감동을 주는 맛은 아니었다. {回民街|회민가}의 식당은 이처럼 일반적인 가격보다 비싼 값을 받는 주제에 음식 수준은 더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방문을 추천하지 않는다.

배를 채우고 호텔이 위치한 {騾馬市|뤄마스} 상업거리로 돌아왔다. 이곳은 {回民街|회민가}를 제외한다면 {鐘樓|종루} 근처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일 것이다. 밤이 늦었음에도 넋을 빼고 걷다보면 사람에 치일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은 각종 술집과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새어나오는 맛있는 향미로 가득차 있다. 군데군데 {臭豆腐|취두부} 구운 냄새가 풍겨나와 표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냄새를 맡게 되기도 한다.
그 번화함 속에서 특히 내 관심을 끈 것은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는 가게들이다. 길거리에서 {中俄|중·러}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데다, 러시아 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互貿|상호무역} 상품점을 세 군데나 발견하였고, 이들은 {戰時下|전시 하}의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蜜月|밀월}을 확인케 하는 지표가 되어주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에 돌아와 잠들었다. {西安|시안} 여행의 첫 날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난고 > 유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안 여행 (2) – 비석의 숲과 대당의 불야성 (2) | 2025.05.12 |
|---|---|
| 도카이도 여행 – 아타미에서 시즈오카까지 (3) | 2025.05.07 |
| 미야코섬 여행 (3) - 호우 속 대교를 가로지르다 (1) | 2024.12.02 |
| 오에도 골동시 방문기 外 (0) | 2024.06.17 |
| 미야코섬 여행 (2) – 먀군의 푸른 산호 바다 (4)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