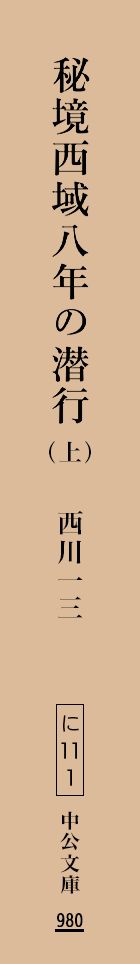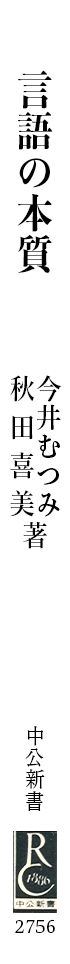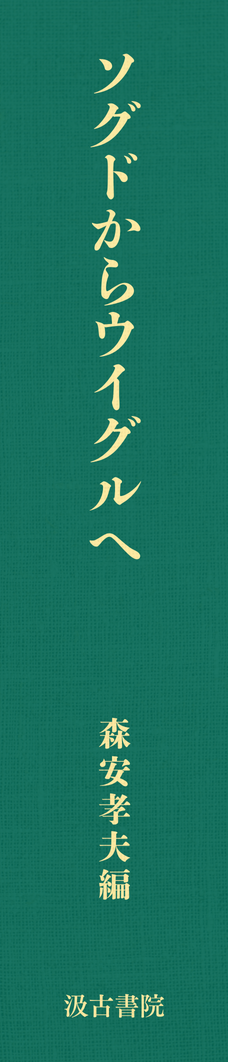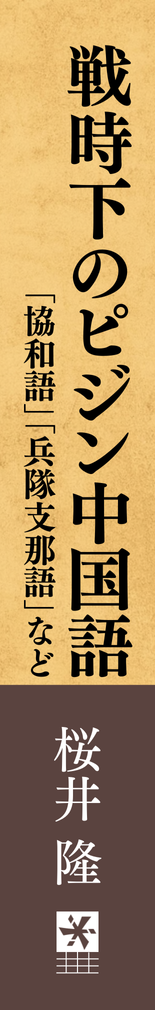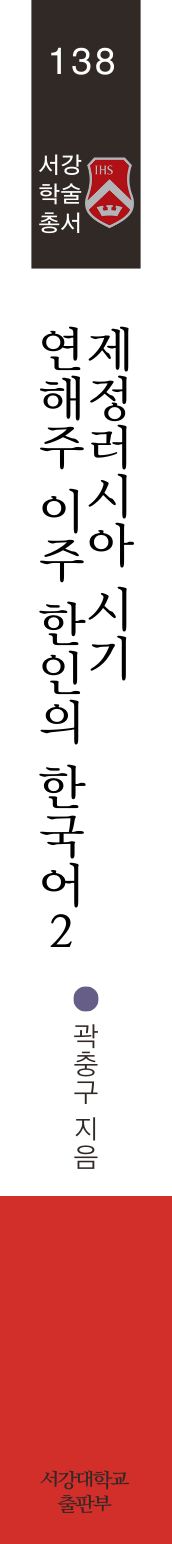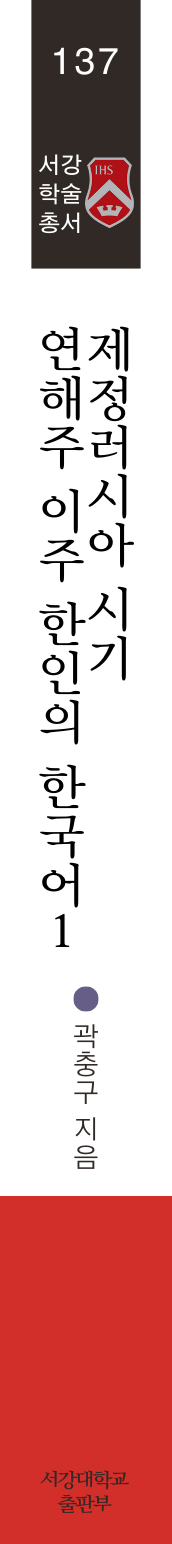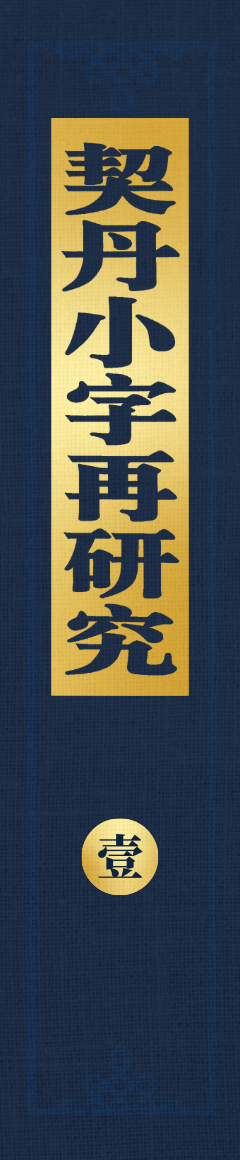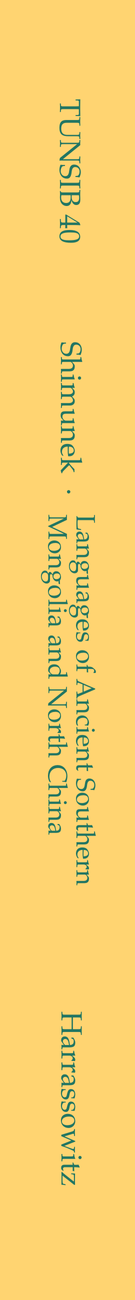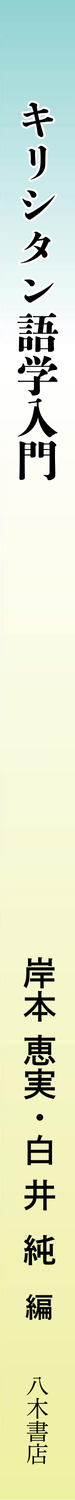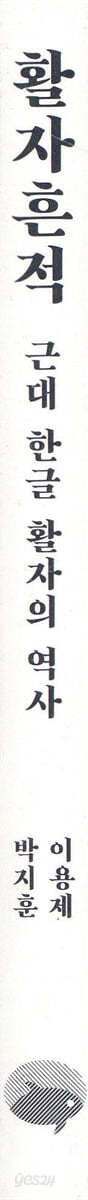건륭 5년(1740년) {作|작}.

自鼓樓東半里而近,有樓巋然臨於四衢之上。居人耳傳,謂明時建是樓,以徙景龍觀鐘。既懸,扣之不鳴,乃返其故所,而鐘樓之稱,至今不改。餘考銘志,鐘鑄於唐景雲之歲,歷世久遠。神物有靈,遷其地而不寧,理或有然者。及登其上,隆中而廣外,巹阿杳窱,重簷週俯,陽藏陰翕,納而不出。餘曰:此鐘之、所以不鳴也。夫聲以曠水以淺,宣者也。故單穆公曰:無射有林,耳不及也。置鐘於深隱之區,猶為之大林也。戴甕以呼,而欲其聲之及遠,必不能矣。樓既虛,昔人以祀文昌,蓋即週禮之司命,其典秩自古為隆。而樓之瑰偉雄傑,亦與鼓樓相頡頏。既修鼓樓,並與方伯帥公謀而新之。屍其工者,鹹寧令陳齊賢也。是為記。
{鼓樓|고루}로부터 동쪽으로 반 리 가까운 거리에 사거리를 내려다보며 우뚝 솟은 누각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기를, 명나라 때 이 누각이 지어질 때 {景龍觀|경룡관} 의 종을 옮겨왔다고 한다. 그러나 종을 걸고 쳐보니 울리지 않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졌으며, 그럼에도 {鐘樓|종루}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았다. 《{銘|명}》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니, 그 종은 당나라 {景雲|경운} 연간에 주조된 것으로 세월이 오래되었다. 신령한 물건이기에 그 자리를 옮기면 안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치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누각 위에 올라 살펴보니, 안은 높고 바깥은 넓게 트였다. 지붕은 아득히 솟았고, 겹처마가 둘레를 감싸며 아래로 드리워졌다. {陽氣|양기}는 숨고 {陰氣|음기}는 모였으며 소리는 갇혀 나가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종이 울리지 않는 이유다. 소리는 공간이 넓어야, 물은 얕아야 널리 퍼진다. {單穆公|단목공}이 말하기를, “숲이 울창하면 귀에 닿지 못한다. 종을 깊숙한 은폐된 곳에 둠은 마치 거대한 숲 속에 둠과 같다. 항아리를 씌워 소리를 내게 하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길 바란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누각은 비어 있었으며, 옛 사람들이 이곳을 {文昌帝|문창제}를 모시는 곳으로 삼았던 것은 《{周禮|주례}》의 {司命|사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규범은 예로부터 중시되었으며, 이 누각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鼓樓|고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할 수 있다. 고루를 이미 수리한 뒤, 우리는 {方伯|방백} {帥公|사공}과 함께 모의하여 이 누각도 새롭게 하였다. 공사를 책임진 이는 {咸寧縣|함녕현} 현령 {陳齊賢|진제현}이었다. 이를 기념하여 기록한다.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한국성경대전집』(2002) 목록 (0) | 2025.03.06 |
|---|---|
| 아랍어 〈청진월비〉 발췌역 전재 (0) | 2025.02.20 |
| 왜정시대 조선의 에키벤 관련 신문 기사 (0) | 2025.01.15 |
| 신태현(1958) 〈거란문자고〉 《사조》 1 (2): 251–255 (1) |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