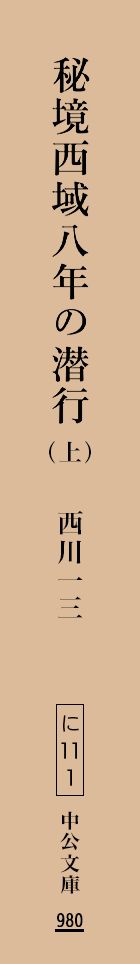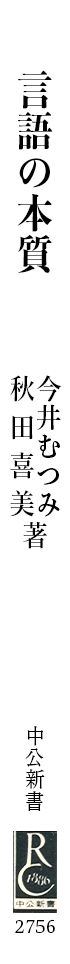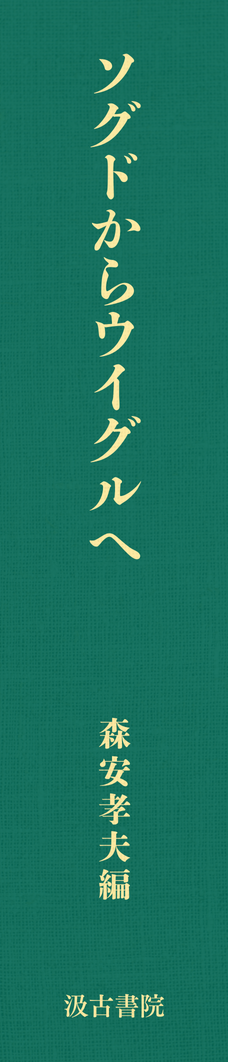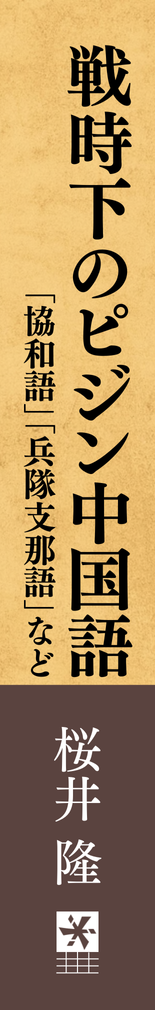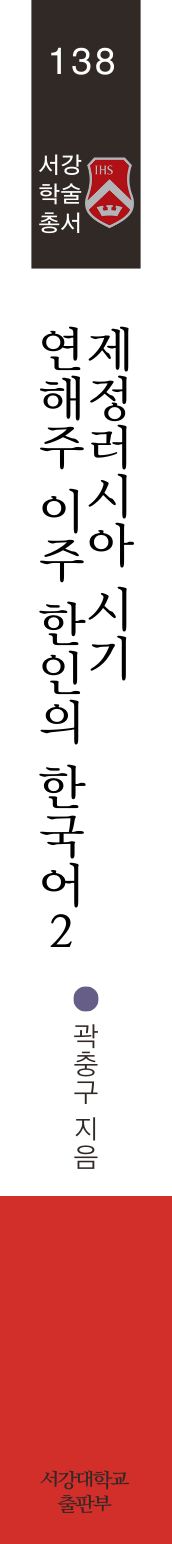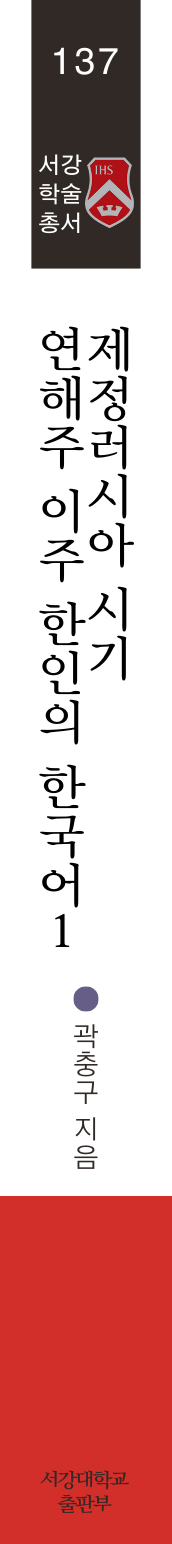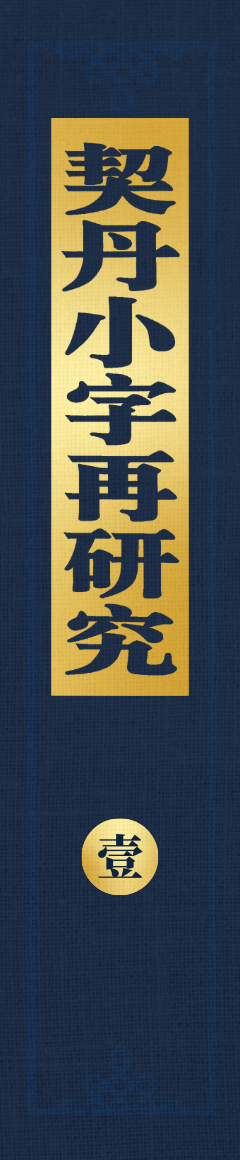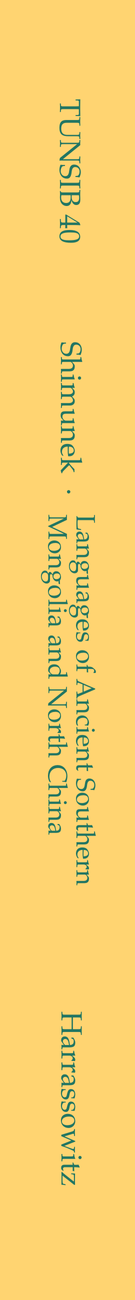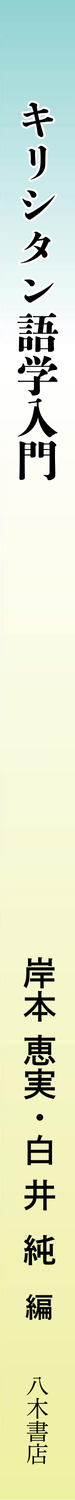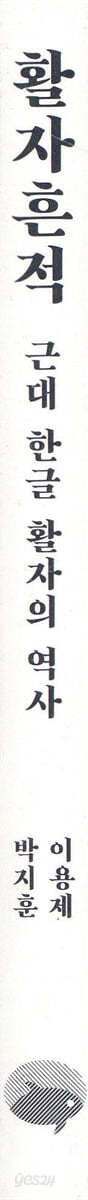국내 거란어 연구의 선구자인 신태현辛兌鉉이 월간 《사조思潮》 1958년 창간 2호에 기고한 논문을 전자화한 것이다.
硏究發表論文 《史學篇》
契丹文字考
東洋의 北方民族중에서 처음으로 자기나라 固有의 문자를 가졌던것은 突厥과 回紇이었다。그후에 北方민족 사이에는 이것에 자극을 받아서 국민적 自覺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어 漢字에 의존하지않고、자기의 국어를 記寫하기 위해서 독특한 文字를 만들었던 것이니、이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즉 契丹文字라던지、女眞문자라던지、蒙古문자、滿洲문자등은 이러한 民族的자각에서 생긴 文字인 것이다。여기서는 그중에서 비교적 오랜 契丹文字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契丹文字의 제작에 대해서는 遼史本紀에 遼의 太祖가 神冊五년에 처음으로 契丹文字를 지어서 詔書를 내려서 이를 頒行시켰다고 하였다。또 契丹國志太祖紀를 보면 渤海가 이미 평정되었으므로 이에 契丹文字 三천餘言을 지었다고 하였다。또 契丹小字의 제작에 관해서는 遼史皇子表에 回鶻의 使者가 왔을때에 그 언어가 불통하였으므로 太祖는 迭剌라는 총민한 사람을 시켜 二十日동안 相從케 하여 능히 그 언어와 글을 배우게 하고 因하여 契丹小字를 지었는데、그 數가 적고도 該貫했다。즉 널리 통했다고 적혀있다。이것으로써 契丹에는 契丹大字와 契丹小字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그러면 契丹文字를 만들때에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느냐 하면、五代史 契丹傳을 볼것같으면 太祖인 阿保機가 隣邦의 여러 小國을 모두 服屬시키고 漢人을 많이 쓰게 되자 漢人이 그를 가르쳐 隸書의 半을 增損(字劃을 加減하는 것)해서 文字 수千을 지었다고 하였다。즉 『漢人敎之、以隸書之半增損之、作文字數千、以代刻木之約』이라 하였다。陶宗儀의 書史會要라는 책에도 그 의미와 비슷한 글이 보이는데、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阿保機・・・・多用漢人、敎以隸書之半增損、製契丹字數千、以代刻木之約、其字如朕◯敕◯走馬急之類是也。』
이것으로써 契丹文字의 제작원리를 짐작할 수 있다。즉 契丹文字는 漢字의 隸書를 기본으로 삼아서 다소 그 형체를 가감해서 만든것이다。金史完顔希尹傳을 보면 金나라 사람이 처음에 文字가 없어서 契丹字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고、그 다음에 이러한 글이 있다。
『太祖命希尹、撰本國字、備制度、希尹乃依倣漢人楷字、因契丹字制度、合本國語、製女眞字。』
이것으로써 契丹文字가 漢字를 기본으로 삼았던 사실과、女眞文字도 契丹文字제작의 원리에 따라 漢字를 모방해서 만든것임을 알수 있다。
대체로 中國의 隣邦국가에서 그 固有文字를 만들때에는 흔히 漢字를 기본으로 삼고서 漢字의 劃을 가감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주로는 그 劃을 생략해서 간단한 文字를 만든것이다。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해내려오던 日本의 「가나」(假名=カナ)는 「히라가나」(平假名=ヒラカナ)、「가다가나」(片假名=カタカナ)가 모두 漢字의 劃의 일부분을 취해서 原漢字의 音으로 사용한 것이고、또 우리나라의 李朝시대에 사용하던 토(吐)의 略體文字도 가나(假名)제작과 똑 같은 방법으로 생긴것이다。이 밖에도 西夏文字가 있는데、대단히 복잡한 文字이지만 이것 역시 漢字를 모방해서 만든 文字이다。이와같이 漢字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文字들을 一括해서 나는 「漢字系文字」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으로서 契丹文字는 漢字系文字임이 분명하다。그러면 그 契丹文字는 어떤 모양의 文字인가를 소개해보자。契丹文字로 종래 알려진것이라고는 앞에 말한 書史會要에 실려 있는 다섯글자밖에 없었다。金若萃編이라는 책에 大金皇弟都統經略郞君行記라는 것이 있다。여기에는 이상한 글자로 글을 써놓고、그 뒤에 漢文으로 對譯을 붙인것이 보인다。이것을 종전에는 女眞文字라고 생각하고 있었다。「大金皇弟」라는것은 金의 太宗의 아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文字를 女眞文字로 알고 있은 것이다。그런데 遼代의 慶州 즉 白塔子(Cagan Soborga)의 東北 山중에 遼의 聖宗、興宗、道宗의 세 陵이 있는데 그 東 西 中의 三陵가운데 中陵에서 一九二二년七월二十一일에 돌에 새긴 契丹字의 墓誌銘이 두개나 漢字로 된 墓誌銘과 함께 발견되었다。이것은 遼의 陵에서 발견된것이므로 契丹文字에 틀림없는 것인데 앞서 말한 郞君行記의 文字도 이와 똑 같은 종류의 文字이므로 종래 女眞文字라고 생각한것은 실은 契丹文字인 것이다。이 中陵에서 발견된 契丹文 哀冊二點이 누구의 墓誌銘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정치 않았다。Periot氏는 中陵을 道宗의 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哀冊 즉 墓誌銘을 道宗과 그 皇后의 것으로 보고、Mullie氏는 中陵을 聖宗의 陵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에 이 哀冊을 聖宗과 그 皇后의 것으로 比定하고 있다。그런데 그후에 또 契丹文哀冊이 발견되었다。滿洲事變후에 奉天의 湯玉麟의 아들 湯佐榮의 저택에 碑石이 二十개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漢文으로 된 帝后의 篆蓋、哀冊이 각각 두 개 있었다。그래서 모두 四個의 哀冊이 나타났는데、羅福成씨는 遼陵石刻集錄이라는 책에 이것을 전부 수록하고、이것을 각각 道宗、그 宣懿皇后、興宗、그 仁懿皇后의 哀冊으로 단정하고서 漢文哀冊과 대조해서 부분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羅福成씨의 이러한 단정은 아무런 論證이 없었으므로 학자들중에는 이것을 의심하는 자가 있게 되었다。그 때문에 나는 靑丘學叢 제二十八號에 「契丹文哀冊に就いて」라는 論文을 발표해서 羅씨의 단정이 확실함을 一一이 논증했던 것이다。그 論證의 방법을 잠간 적어보겠다。
哀冊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漢文哀冊의 年記의 양식을 보면 대체로 이러한 순서로 되어있다。——維(年號)(若干)年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그러므로 契丹文哀冊중에 나타나 있는 年記는 契丹文字의 같은 글자의 이러한 順次배열로써 용이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그래서 나는 그들의 年記만을 모든 哀冊文중에서 빼어다가 앞에 말한 郞君行記에서 밝혀진 약간의 干支와 숫자를 근거로 해서 한字 한字 解讀하여 갔다。十干 十二支의 組合방식은 奇數番째의 干은 반드시 奇數番째의 支와 組合하고 偶數番째 干은 반드시 偶數番째의 支와 결합한다。干支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未知의 干支를 알아내고 그 干支에 해당하는 年月日을 찾아냈다。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네개의 哀冊文 중에 적혀있는 契丹文年記가 전부 解讀이 되어서 이들은 道宗、그 宣懿宮后、興宗、그 仁懿宮后의 哀冊임을 확인한 것이다。이들의 契丹文哀冊에 대해서는 이에 對比할 漢文의 哀冊이 있으므로 契丹文과 漢文과는 대조연구하면 契丹文字의 하나 하나의 뜻은 어느정도 밝힐 수 있다。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상당數의 契丹文字의 뜻을 알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契丹文字의 읽는 法을 밝혀야 할 契丹語를 알 수 있겠는데、이것이 문제인 것이다。이제 契丹文字의 성질에 대해서 적어보겠다。契丹文字의 읽는 法을 밝히는데는 몇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篆蓋에 적혀있는 文字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이다。篆蓋라는 것은 哀冊文을 새긴 墓(誌銘)石을 덮어놓은 돌뚜껑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아무개의 哀冊文이라는 글자를 새기는데 篆字體로 새겨있으므로 이것을 篆蓋라고 한다。이 篆蓋에 쓴 文字를 보면 哀冊文에 하나의 글자로 된 것을 여러字로 分解해서 縱書로 써 있다。한글자를、혹은 두字로、혹은 석字로 나누고、혹은 넉字이상으로 分解한 것이 있다。예를 들면 「宣懿皇后哀冊文」이라는 뜻을 契丹文哀冊文에는 𘰷𘭨𘯐 𘱤𘱤 𘱗𘱮 𘬝𘰭 𘱚𘲦𘲫 𘲽𘰄 𘭙𘳕라고 하였는데 篆蓋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썼다。

이것을 보면 契丹文字는 일종의 複合文字로서 그것을 基本文字로 分解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시 말하면 基本文字를 여기에 모아서 漢字式으로 一字一義를 갖춘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많은것은 四字로부터 七字까지 모은것이 있다。그런데 그 모으는 방식은 왼쪽(左)을 먼저 하고 옳은쪽(右)을 후에 하고 위(上)로부터 아래(下)로 내려가는 것이다。이것은 마치 漢字를 써가는 순서와 같은 것이고、우리의 한글의 모으는 방식과도 동일한 것이다。契丹文字가 과연 기본文字의 組合으로 되어있다면 그것이 表意文字이건 表音文字이건간에 하나하나의 글자의 읽는 법을 연구하는 첩경은 모든 文字를 基本文字로 分解하여가지고 그 분해될 基本文字를 연구하는 길밖에 딴 길이 없을 것이다。그래서 나는 郞君行記를 비롯해서 哀冊文에 적혀있는 契丹文字를 일일이 分解해서 基本文字를 추려보았다。이렇게 해서 다른 모양의 글자만을 세어보았으나 그 數가 막대해서 이러한 연구는 완전히 停滯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記錄에 契丹文字 三千餘言을 지었다고 하였고、또 契丹字 數千을 지었다 하였으니 기본文字의 수가 실제로 그만큼 있었는지도 모른다。이러한 점으로 보면 一音一字의 원칙은 契丹文字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그런데 여기에 또하나 연구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본文字中에 漢字 그대로의 文字가 많이 섞여있는 사실이다。公、山、穴、口、丁、杏、包、月、力、伏、丙、丈、巫、仕、及、由、友・・・・등 허다한 漢字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漢字의 古字가 더욱 많이 契丹文字를 구성하고 있다。그것은 宋本玉篇이라든지、篆隸萬𧰼各義(崇文叢書中)라던지、龍龕手鏡、說文解字등을 보면 契丹文字를 허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이와같이 契丹文字는 漢字 그대로를 채용한것이 많은데、그러면 漢字를 어떻게 사용한 것인가가 문제이다。漢字의 訓을 借用했다고 하면 글자의 읽는 법은 다르겠지만、뜻은 漢字의 訓과 동일하여야 할터인데 契丹文字를 보면 漢字 그대로의 형태일지라도 그 뜻은 다른 것이다。예를 들면 契丹文字의 「山」은 「己」의 뜻이고、「丁」은 「二十」의 뜻이고、「杏」은 「丑」의 뜻이고、「口」는 「同」 혹은 「其」의 뜻이고、「穴」은 「正」의 뜻이다。그러므로 漢字의 訓借가 아니고 보면 音을 借用한 것으로 볼수있겠다。이러한 論法으로 말하면 漢字 「山」의 音은 「산」이므로 契丹字 「山」으로 표시된 「己」의 뜻을 가진 契丹語는 「산」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것은 그리 속단하기는 곤난한 것이다。왜냐하면 漢字系文字의 제정에 있어서는 흔히 漢字의 訓을 생략해서 고유文字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契丹字 「山」은 다른 漢字의 略體일 수도 있는 때문이다。다른 또 하나 예를 들면 日本의 가나(假名=カナ)에 있어서 「エ」(에)는 漢字의 「工」字와 같은 字이지만 「江」의 略이므로 音이 「고오」가 아니라 「에」이고 「オ」(오)는 漢字의 「才」字와 같은 字이지만 「於」字의 略이므로 音이 「오」이고、또 「カ」(가)는 漢字 「力」字와 같으나 「加」字의 略이므로 音이 「가」인 것이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보아서 契丹文字가 비록 漢字 그대로의 字形을 가졌다 할지라도 漢字音 그대로 읽을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漢字音 그대로의 音借가 아니라면 그 글자가 어떤 漢字의 略體인지를 밝혀서 그 順을 찾아야 할것이다。그러나 契丹文字의 音을 알기 전에 어떤 字의 略體인지를 알아내기는 더욱 어려운 말이므로 契丹文字의 音을 알아내는데는 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그것은 女眞文字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다。女眞文字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契丹文字의 제도에 따라 漢字의 楷字를 모방해서 만든것이므로 契丹文字와 비슷한 字가 많으며、또 女眞文字의 音은 오늘날 대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연구해서 契丹文字 해명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물론 女眞文字에는 表意文字와 表音文字의 두 종류가 있으므로 表音文字만을 추려서 연구하여야 할줄 안다。
契丹文字에 대한 나의 고찰을 이런 정도로 그친다。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한국성경대전집』(2002) 목록 (0) | 2025.03.06 |
|---|---|
| 아랍어 〈청진월비〉 발췌역 전재 (0) | 2025.02.20 |
| 왜정시대 조선의 에키벤 관련 신문 기사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