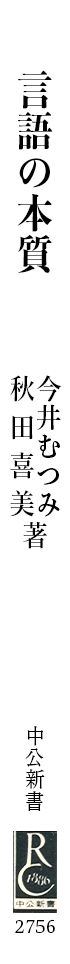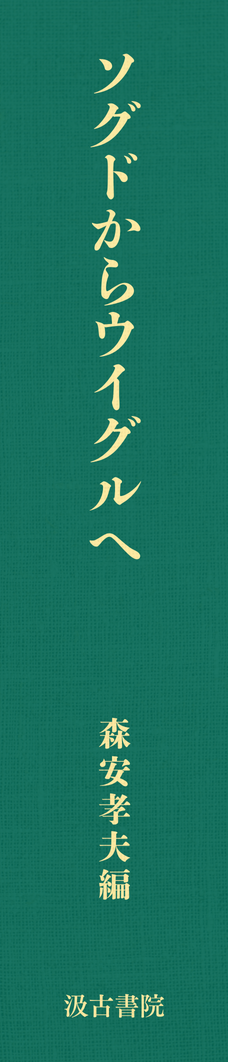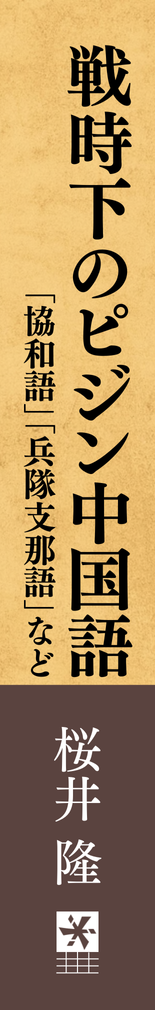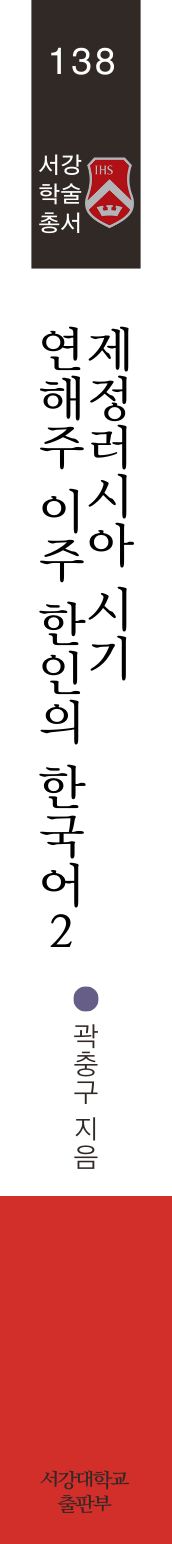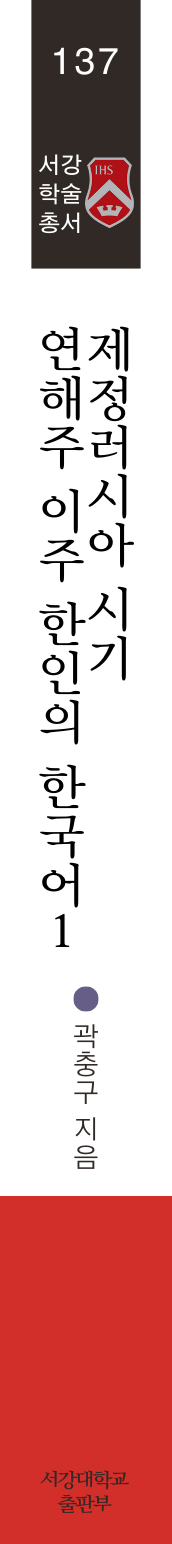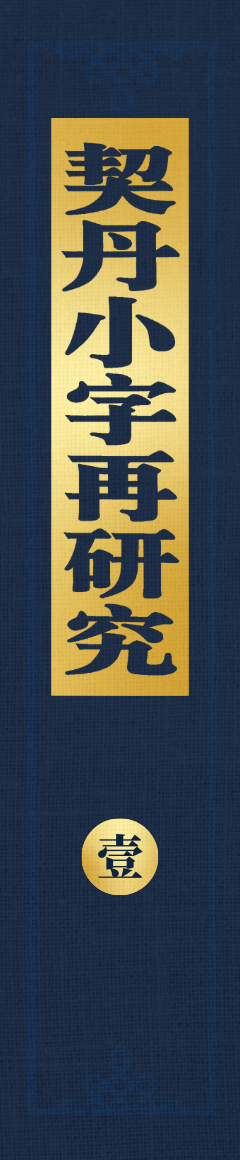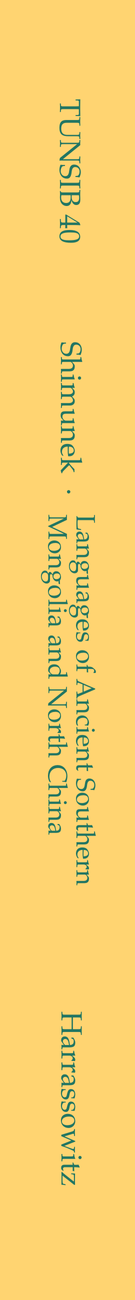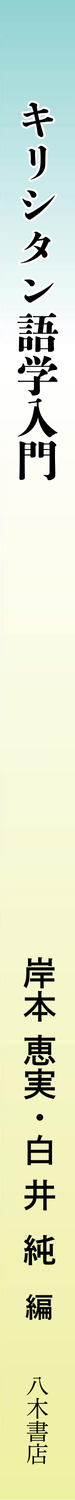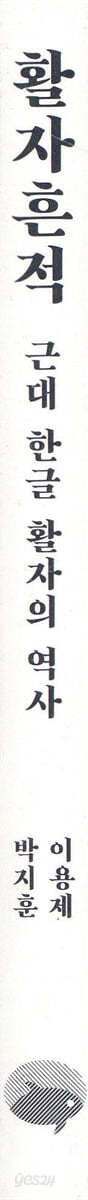※나는 몽골어학과 실험음성학에 대해 그다지 아는 게 없다.
이 글에서, 국내에서 몽골어의 u [ʊ]를 한글로 옮길 때 ‹오›를 대응시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 댓글에서 이 문제가 재차 언급되었으므로 할하 몽골어를 기준으로 음성학 연구를 살펴본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몽골어 모음의 IPA 표기와 실제 음가 사이에는 실제로 괴리(植田가 미스매치라고 부르는 현상)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아래에 할하 몽골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소략한 노트와 내 사견을 기록한다.
노트 및 사견
| o /ɔ/ | ö /o/ |
u /ʊ/ | ü /u/ | ||
| Цолоо (1976) | [o] | [ɵ] | [u] | [ʉ] | |
| 栗林均 외 (1997) | [ɔ] | [ɵ] | [ɷ] (=[ʊ]) | [ʉ] | |
| 김기성 (2001) | [ʌ] | [ə] | [o] | [u] | |
| Svantesson (2005) | [ɔ] | [ɵ] | [oː] | [ʊ] | [u] |
| 이규성 외 (2009) | [ɔ] | [ʊ] | [o] | [u] | |
| Janhunen (2012) | [ɔ] | [o] | [ʊ~o] | [u] | |
한글 표기를 정함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는 네 모음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음가를 일목요연하게(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생략되게) 정리하였다.
Svantesson et al. (2005)은 개방성, 원순성, 인두성의 세 자질로써 몽골어 할하 방언의 모음 체계를 설명한다. 이는 몽골어 모음조화가 ‘인두성’이라고 명시된 설축성(RTR) 자질에 기반한다는 분석으로, 모음의 전후성은 대립 자질로 고려되지 않는다. Ko (2019)는 Svantesson et al. (2005)의 체계가 몽골어 모음동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립 위계 이론의 관점에서 [coronal] > [low] > [labial] > [RTR]의 위계적인 대립 자질을 설정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전후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Janhunen (2012:155) 역시 [ɔ]와 [ʊ]에 인두성이 수반된다고 언급하며, 이들이 각각 [o] [u]와의 변별되는 요인을 모음의 전후성에서 찾지 않는다.
실제로 비교적 종합적인 할하 몽골어 모음 연구인 植田(2018)의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네 모음의 F2 편차가 그 F1 편차에 비해 크게 측정되는데, 내 생각에는 대립 자질로서의 전후성의 부재가 이에 관한 자유 변이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포르만트 측정치를 단순히 평균내어 모음의 전후 정도를 기계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몽골어 모음 체계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대신에 몽골어 모음 체계의 대립 자질을 고려하여 한글 표기를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해보인다. 특히 /o/와 /u/는 F1 플롯이 매우 정밀precise한 데 반해 F2 플롯은 넓게 퍼져서 분포하여, 이들의 자유 변이음이 전후로 여유있게 실현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화자의 성별을 나누어 측정치를 가공하면, 평균치로 나타나는 /o/와 /ʊ/의 전후 위치가 남녀 간에 역전되는 현상조차 확인된다.
植田(2018)는 /o/, /ʊ/에 대해 각각 [ɵ~o], [ʊ~o]의 음가를 제시하였는데, 둘 다(전자의 경우 단모음에 한하여)에 대하여 각각 /ɔ/, /u/에 비해서는 중설 모음에 가깝다(中舌寄り)라고 결론지었다. 그가 이들이 완전한 중설 모음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게다가 화자의 성별 차이에 따라 모음 별로 평균적인 전후 위치가 반전된 결과로 나오기도 하므로 대단히 까다롭다. 또한 평균적으로 /ʊ/가 /o/에 비해 개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모음 짝에서는 둘의 개구도가 거의 같게 나온다. 이들 네 모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바, /u/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모음은 장단을 막론하고 한글 ‹오›로 적히기에 적합한데, 이는 /ʊ/의 개구도가 /o/보다 높게 나타나는 미세한 경향이 있어 도저히 전자를 ‹우›로 후자를 ‹오›로 나누어적을 수 없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중설 원순모음이 없는 한국어의 특성상 앞선 언급했듯이 모음의 전후는 대립 자질이 아니므로 중설적인 /o/에 대해서도 ‹오›를 제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에 3중 부담을 지우는 방안은 과연 이상적인 표기일까.
단국대 《몽한대사전》(2023)은 내가 실물을 본 적이 없어 무어라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 존재하는 가장 방대하고 권위 있는 몽골어·한국어 사전인 점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 사전이 채택하였다는 몽골어의 한글 표기안은 김기성(2001)에 의한 것인데, 위의 표에서도 보았듯이 김기성(2001)이 제시하는 문제의 네 모음의 음가는 홀로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다. 그가 어째서 /ɔ/ 및 /o/에 대해 원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는 관련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는 /ɔ/, /o/, /ʊ/, /u/에 대해 한글 ‹어›, ‹어›, ‹오›, ‹우›를 배정하였다. 이규성 외 (2009)에서는 /o/의 원순성을 추상하고 중설적인 음성 실현을 중시하여 ‹으›를 배정하였는데, 앞서 언급했지만 전후성은 대립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 변이음으로서 실제 음성 실현은 전후로 넓게 나타날 수 있는 데다가, 한국어에는 원순 중설모음이 없으므로 몽골어 /o/의 한글 표기로 ‹으›를 마련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셈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유원수(2004) 《몽골비사》의 서문에는 /ɔ/ 및 /ʊ/에 대해 한글 ‹오›, /o/ 및 /u/에 대해 한글 ‹우›를 배정하였는데, 원순성과 개구도만로 한정하여 고려하면 김기성(2001)에 비해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 상기 네 모음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유원수(2004)의 표기 방침을 답습할 것이다. 사실 /o/도 순수 폐쇄음의 F1 값이 나오지는 않지만, /ɔ/, /o/, /ʊ/에 대해 모두 ‹오›를 배정하기에는 부담이 지나치다.

'언어 > 선비·몽골어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란문자 위조 골동품 (3) | 2025.03.10 |
|---|---|
| 거란어의 한글 표기안 (10) | 2024.12.24 |
| 거란소자 자소 번호 317번의 음가 추정 (0) | 2024.12.23 |
| 거란대자 자소의 표음 유형에 따른 분류 (0) | 2024.12.10 |
| 거란문자 자료에 나오는 고려 (9)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