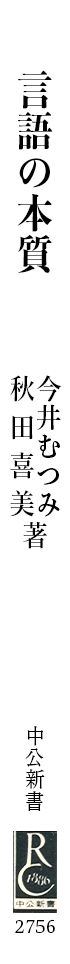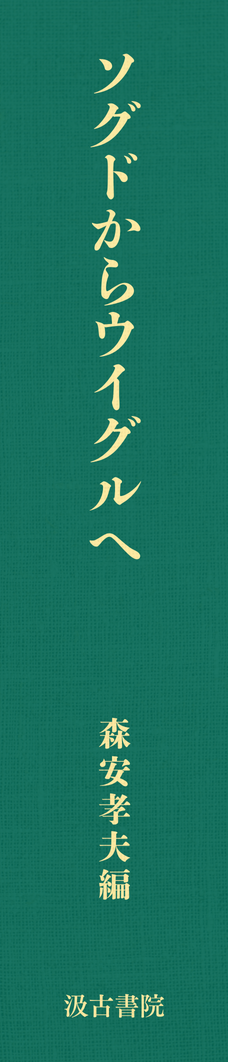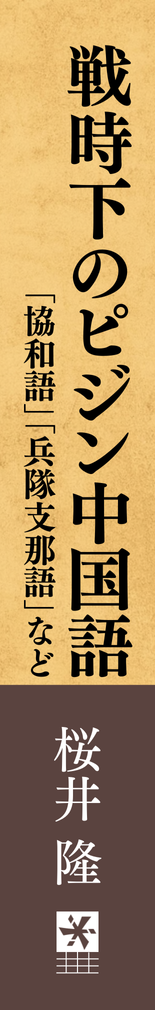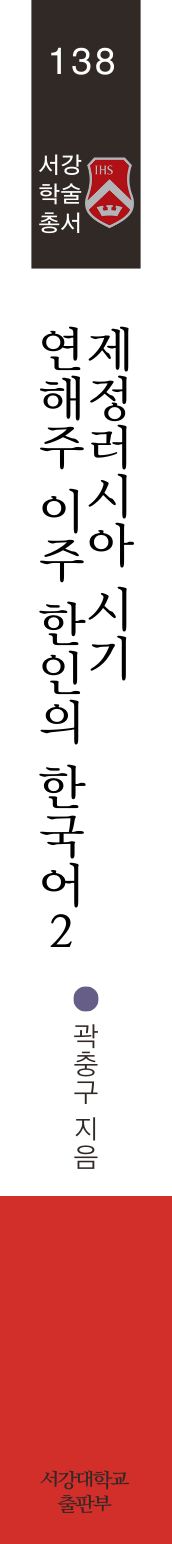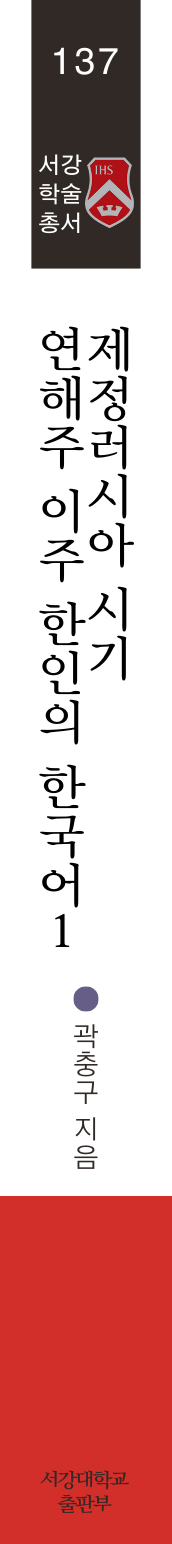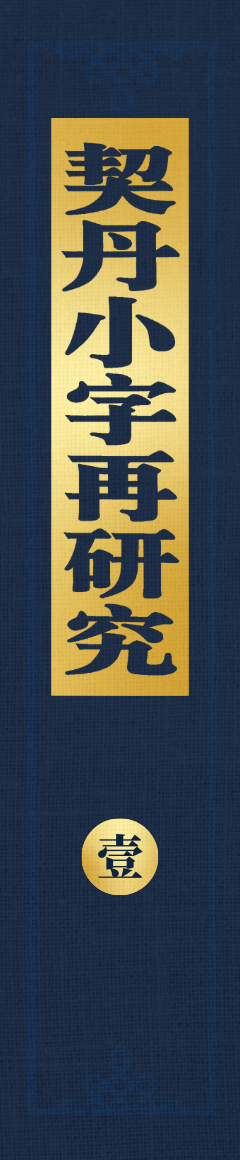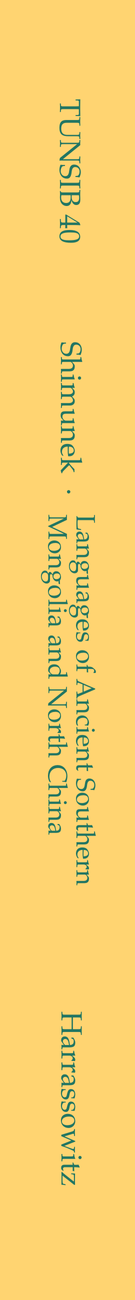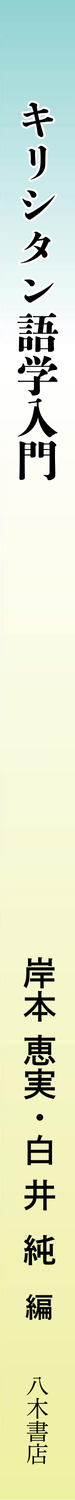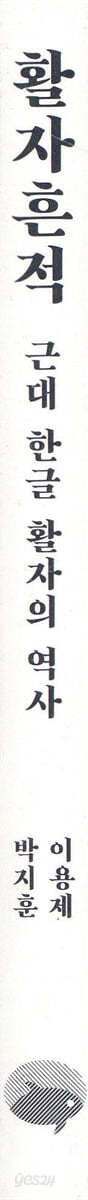남을 속여먹는 행위도 생업이 될 수 있다. BabelStone 블로그의 운영주이자 동아시아 문자 부호화 작업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아온 앤드류 웨스트(중국명: 魏安)는 일찍이 2013년에 「Fake Khitania」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중국의 骨董市에서 契丹文字가 나타나는 「진귀한」 골동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진귀한 것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二律背反的인 현상은 어느샌가 중국을 벗어나 我國에서도 목격되기 시작했다. 2023년경에 나는 복수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契丹小字로 작성된 贗書를 세 권이나 발견하였고, 그중 둘은 이미 심히 過分한 값으로 거래가 성사된 상태였다.
契丹文字쯤 되면 아무리 考古學에 빠삭한 수집가라도 하더라도, 그 내용만을 통해 眞否를 가려낼 수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거란문자 石刻 자료의 眞僞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리곤 한다. 다만 그 대상을 서책으로 한정할 경우, 현명한 수집가라면 贗品 특유의 조잡한 만듦새와 시대착오적인 裝幀 등의 주변적인 요소를 통해 骨董의 眞否를 考證해낼 수 있을 테다. 契丹文字와 같이 解讀途上에 있는 古代文字로 작성된 서책으로 말하자면, 門外漢도 단번에 위조품을 식별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한다. 다음은 내가 2023년 3월 18일에 김노유 외(2022)에 제시된 「거란문자 고문서」에 대한 앤드류 웨스트 씨의 의견을 여쭌 뒤에 받은 회신의 國譯이다.
논문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기는 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현대적인 위조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요소들입니다. 우선 종이가 아닌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고문서에 적합한 옛 종이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가죽은 오래된 것처럼 꾸미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彩畵가 들어가 있다는 점(사멸한 언어의 문자를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가 아주 커서 각 페이지에 적힌 글자 수가 적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설픈 거란문자와 알려지지 않은 글자들이 섞여 있다는 점 역시 위조품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논문에서 혹시 이 문서의 출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나요? 만약 인터넷에서 단순히 구입한 것이라면 분명히 위조품일 것입니다.
骨董蒐集을 奢侈品 쇼핑처럼 여겨 괜히 千金을 虛費하는 이들을 警覺시키기 위해, 국내 논문에서 발견한 두 종류의 「거란문자」 위조 서책과 그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현존하는 거란문자 서책은 契丹大字 자료 Nova N 176이 「유일」하므로, 누군가 「거란문자」 서책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 출품한 바를 목격할 시 무엇보다 의심하는 안목을 가짐이 현명하다.
김노유 외(2022)
김노유 외(2022) 논문은 적외선 열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고문서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가시화하는 신기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서지 사항과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해 웨스트 씨가 지적한 현대적인 위조품의 전형적인 특징이 모두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논문의 本旨는 거란문자와 관련이 없는 공학 분야의 것으므로,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김노유 외(2022)에서 언급되는 「거란문자」 서책은 언뜻 보아도 위조품임이 분명하며, 내용 면에서는 𘲐 ‹ay›, 𘬗 ‹od›, 𘰴 ‹əd›, 𘬜 ‹əy›, 𘭢 ‹əəl› 등 실존하는 字素가 교묘히 섞여든 탓에 그럴싸해보일 수 있으나, 其實 대부분은 무의미한 직선과 곡선의 조합일 따름이다. 이러한 거짓 텍스트는 해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할 의미도 없다.
남권희(2013)
거란소자 연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 연구인 김주원(2017)의 末尾에는 「최근에 발견된 자료」로서 남권희(2013:78)에서 소개된 거란어 자료를 제시한다. 아쉽지만 나는 해당 발표논문을 入手하지 못하였으므로 「新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논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김주원(2017:114)에 매우 간략한 解題와 사진이 실려 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가 타당한 거란소자 자료로서 성립하는지 초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남권희(2013)에 소개된 新자료는 契丹文 경전을 담은 經典函이라고 하며, 上面에 小字 마흔일곱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한다. 김주원(2017)은 해당 자료에 나타나는 글자(字素 조합)의 출현 빈도를 조사함에 그쳤다.

이 자료의 眞否를 따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전함 글귀의 내용을 파악할 것도 없이, 거란소자 정서법에서 특징적인 字素配列 規則이 해당 자료에서도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조사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 우측의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전자화하였다. 판독이 곤란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字素의 경우 「□」로 대체하였다.
𘬪𘭲 𘳕𘱤 𘯟𘰕 𘬢𘱐 𘱹𘰷 □𘮏 𘲜𘲢𘰴 □𘲚 𘬜𘱦 𘰀𘲑 𘭃𘱦 𘱫𖿤𘯈 𘲝𘲺 𘰳𘳆 𘱄𘱯 𘯟𘱿 𘲽𘰐 𘮡𘲚 𘰅𘬪 𘭞𘭲 𘱘𖿤𘳕 𘱚𘭸 𘲜𘭂𘲦
‹iž-uḥʷ un-ii ugʷ-iň 25-269 ew-əz ??-iǰ m-ür-əd ??-uu əy-əər γoy-ar mər-əər ungʷ-onγʷ ǰir-ňer öǰ-χol əl-əğ ugʷ-365 əǰ-lʊʊ üü-uu 198-iž or-uḥʷ ňay-un g-oy m-aḥ-ən›
𘲝𘲺 ‹ǰir-ňer›, 𘰳𘳆 ‹öǰ-χol›, 𘯟𘱿 ‹ugʷ-365›, 𘲽𘰐 ‹əǰ-lʊʊ› 등은 불가능한 조합이다. 𘱫𖿤𘯈 ‹ungʷ-onγʷ›, 𘮡𘲚 ‹üü-uu›, 𘱘𖿤𘳕 ‹ňay-un›, 𘲜𘭂𘲦 ‹m-aḥ-ən› 등은 어색한 조합이다. 무엇보다 이 텍스트는 일반적인 거란어 문장으로서 성립하지 않으며, 한자음을 전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남권희(2013)에 소개된 新자료는 眞實性이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백보 양보하여도 거란어나 중국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결어
거란문자 서책은 세계적으로도 거란대자 Nova N 176 겨우 한 권만이 전할 뿐이다. 骨董市에서 진품의 거란문자 자료를 건져낼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실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中國에서 생산된 贗品은 여러 손을 거쳐 국내에까지 유입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출품된 骨董을 진품으로 맹신하여 함부로 구입한다면, 위조품 제작자들을 후원하는 꼴이 될 뿐더러 헛돈을 날리게 될 공산이 크다. 위조품 시장이 성장해갈수록 연구자들이 접하게 되는 거란문자 자료는 서서히 오염되어 갈 것이다.
'언어 > 선비·몽골어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몽골어 할하 방언의 한글 표기에 관한 문제 (0) | 2025.01.13 |
|---|---|
| 거란어의 한글 표기안 (10) | 2024.12.24 |
| 거란소자 자소 번호 317번의 음가 추정 (0) | 2024.12.23 |
| 거란대자 자소의 표음 유형에 따른 분류 (0) | 2024.12.10 |
| 거란문자 자료에 나오는 고려 (9)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