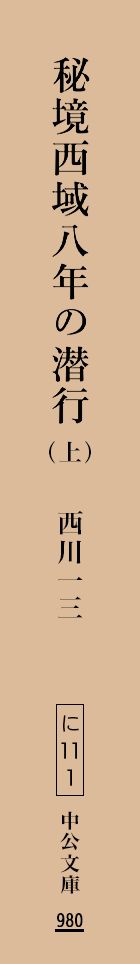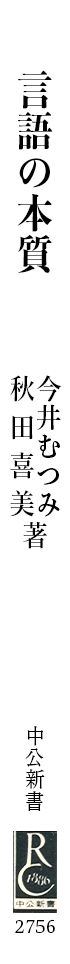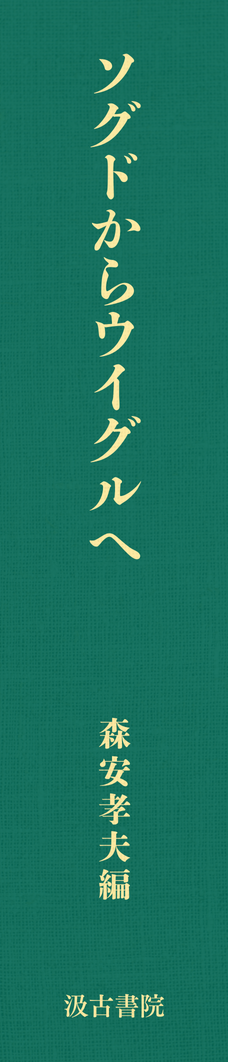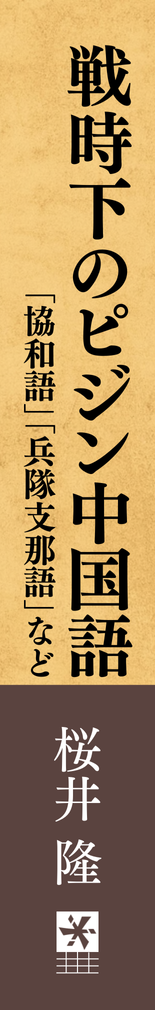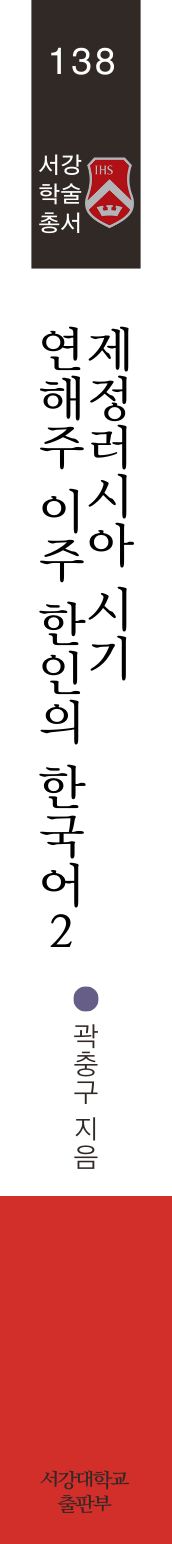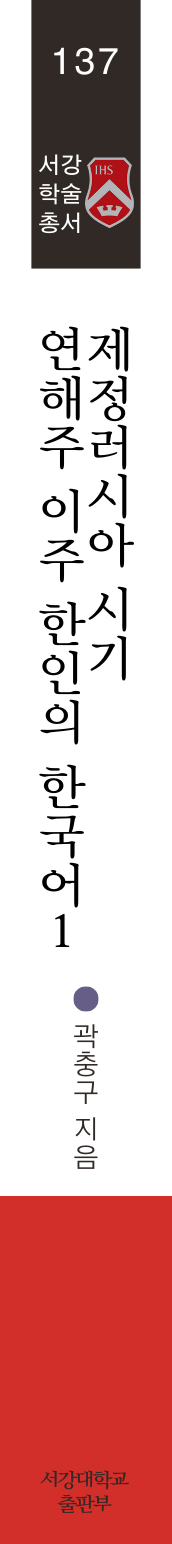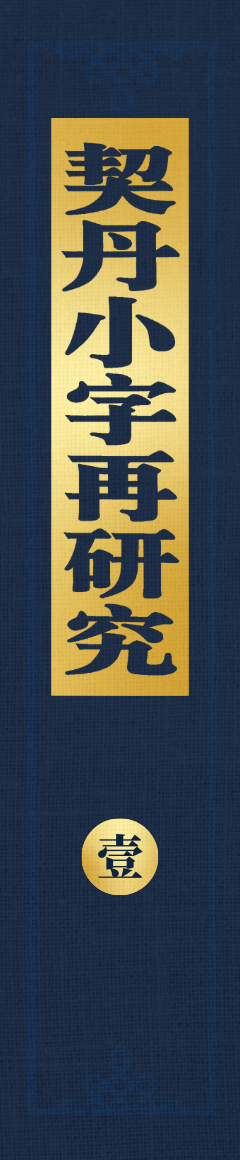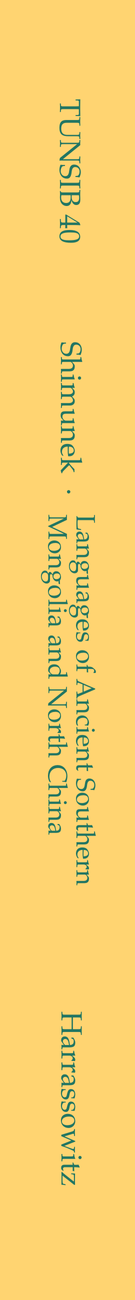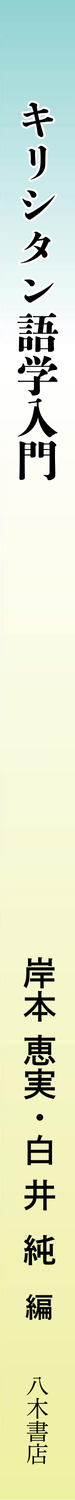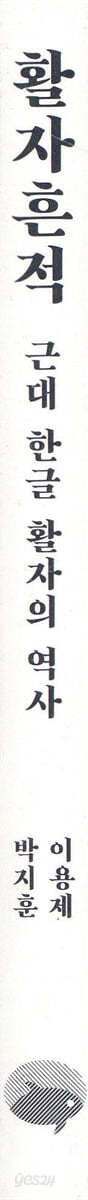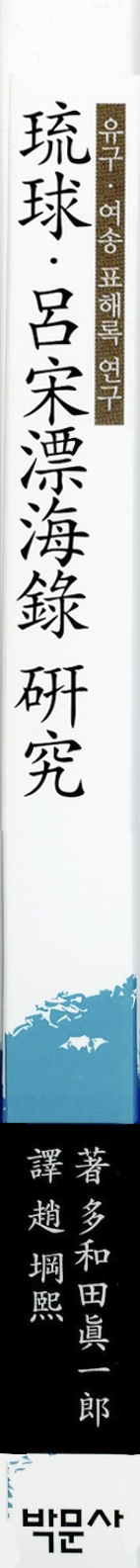짧은 글이다. 지금까지 거란소자의 317번 자소인 𘯃의 음가는 명확하게 알려진바 없었다. 거란어학의 바이블이라고 칭해지는 『거란소자재연구契丹小字再硏究』(2017)의 소자 목록에서 재구음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음가 추정의 고증도 제시되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오타케 마사미大竹昌巳의 최신 논문인 「遼寧清河門西山遼墓出土漢文・契丹文墓誌訳注」(2024)에서도 추정 음가가 미상인 채로 다루어졌다.
나는 거란대자 자료를 근거로 𘯃의 음가를 ‹tad›로 추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거란어 서수사의 거란대자 표기를 근거로 한다. 거란어 서수사 다섯, 즉 “다섯 째”는 거란소자 자료를 통해 남성 단수형 𘰺𘮇𘯶𘭞 tadoor, 여성 단수형 𘰺𘮇𘯶𘯎 tadooň이 익히 알려져 있다. 이 중 남성 단수형의 경우 거란대자 자료에서 의 표기가 대응되어 나타나며, 여기서 의 음가는 ‹tadʊʊ›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거란대자 자소 가 단독으로 “명銘”을 의미하는데, 대응되는 거란소자 표기가 𘯃𘰫 tadʊʊ이기 때문이다. 이 때, 거란어 서수사 “다섯 째”의 거란대자 표기 ‹tadʊʊ-oor›의 경우, 거란소자 체계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자소 직후에 나타나는 자소는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 중복 규칙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거란대자 체계에도 모음 중복 규칙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𘯃𘯶𘭞 †tadoor와 같은 표기가 문증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수중에 있는 자료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아직까지 tadʊʊ의 동원어로 인정될 만한 어휘를 타 언어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지금껏 미상이었던 𘯃와 의 음가를 제각각 ‹tad›와 ‹tadʊʊ›로 잠정하고, “명銘”을 뜻하는 거란어 단어를 tadʊʊ로 잠정하였다.

'언어 > 선비·몽골어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몽골어 할하 방언의 한글 표기에 관한 문제 (1) | 2025.01.13 |
|---|---|
| 거란어의 한글 표기안 (12) | 2024.12.24 |
| 거란대자 자소의 표음 유형에 따른 분류 (2) | 2024.12.10 |
| 거란문자 자료에 나오는 고려 (10) | 2024.06.08 |
| 거란어로 “동녘”은 doru가 아니다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