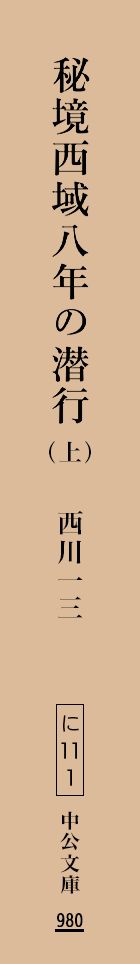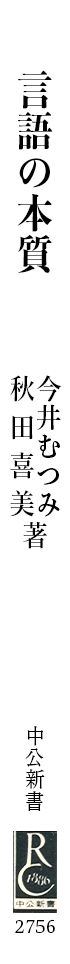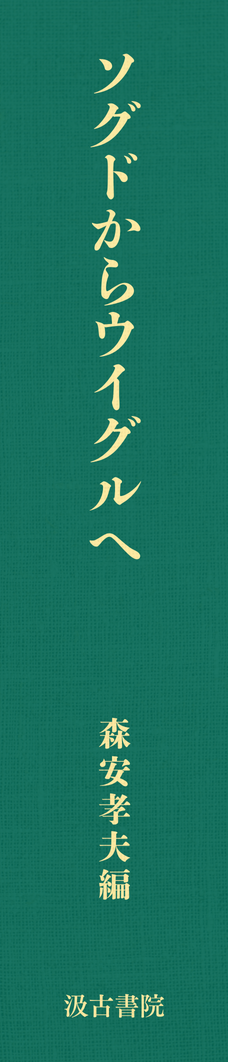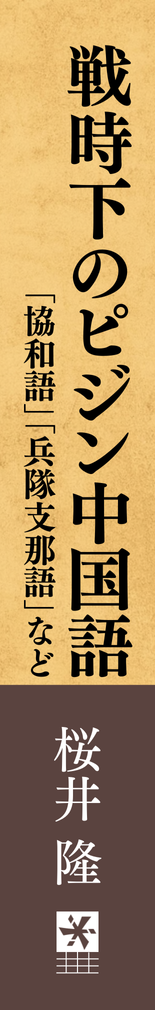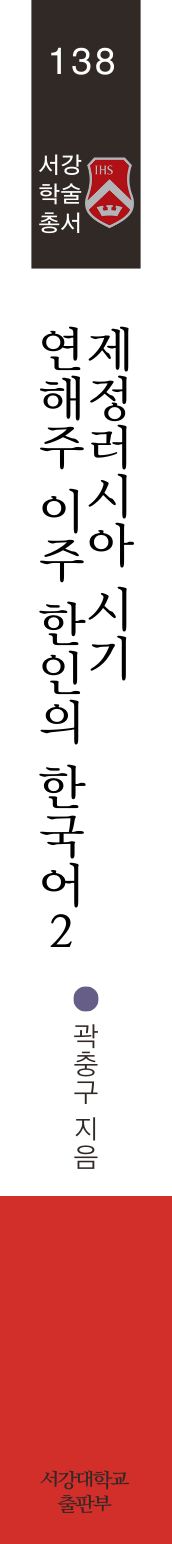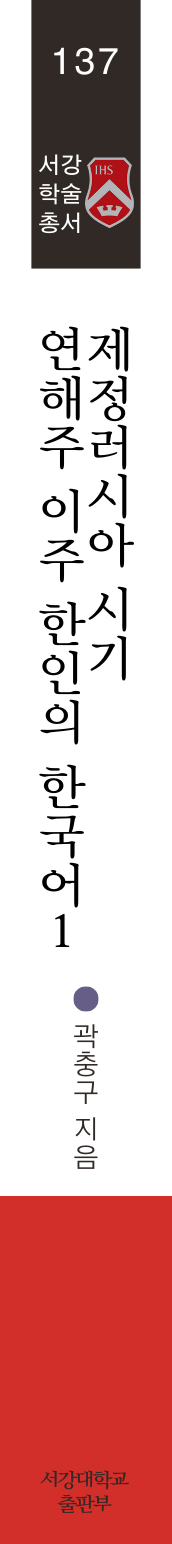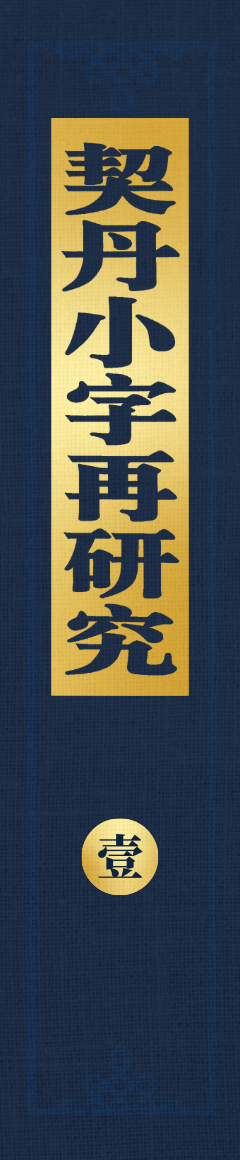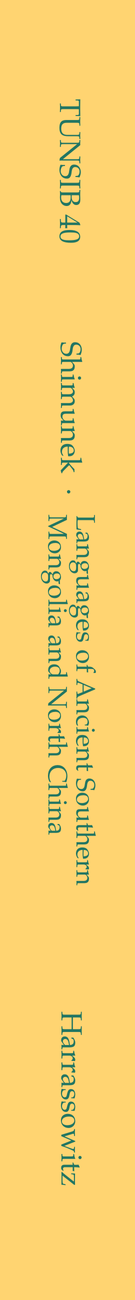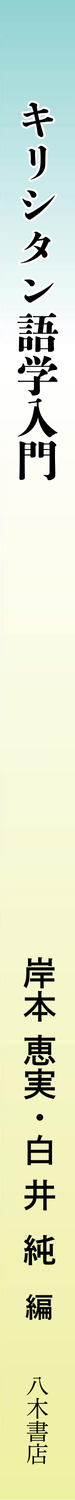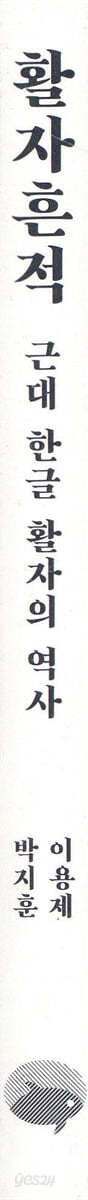나는 오래 전부터 지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종교화된 배외적인 어문 내셔널리즘의 중심에는 괴력난신의 신화를 거느린 거대한 ‘한글’ 우상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식으로 떠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지금껏 이 해괴한 종교의 독실한 신앙자인 줄로 알았던 로스 킹Ross King 교수가 파렴치한 배교적인 발언을 하여 나로서는 몹시 흡족스러운 구도가 펼쳐졌다. 이제 그는 한글 신화 속에서 敵한글로 편입된 것이다.
나 역시 어쨌거나 평균적인 한국인으로서 한글에 대한 다소간의 애착은 가지고 있으나, 우매한 한글 숭배를 바라보는 심정은 또 다른 것이다. 여기서 한글 신화의 부당성과 국어·국자 문제를 거듭 거론하는 것도 미련하니(가볍게 도발하는 이 수준이 적정선이다), 본지에 마땅하게 거란어 고유명을 한글로 표기할 시의 고충을 가볍게 토로하며 향후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게 될 거란어의 한글 표기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외국어를 한글로 옮겨적음에 있어 실로 많은 요구 사항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창안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늘 존재한다. 게다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표기 방안의 유형과 기능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길공구식 만주어의 한글 표기에서 만주어의 /r/과 /l/의 변별을 한글 표기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아라› ‹알아›와 같은 특수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인 화자의 입장에서 무의미한 조치이지만 말그대로 (한국어로서가 아닌) ‘만주어의 한글 표기’로서 고안된 배경을 고려하면 그 목적성이 이해가 되는 대목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립을 유지시키면서 음성적 청각 인상에 근사시키는 이상적인 한글 표기안이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언어 간의 소리 체계가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한국어에 매여 있는 한글의 특성 상, 출현 조건에 따라 다중 부담을 떠안게 된 예컨대 ‹ㅅ›과 같은 자소들을 단독으로 그 본연의 음가로써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음소배열 규칙도 한국어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한글 표기안이란 대개 한국어 화자를 위해 고안되는 것이므로, 한글을 한국어로부터 타자화시킨 표기안은 본말전도인 것이다. 때문에 온갖 희한한 옛 자모와 특수 규칙과 의도를 알기 어려운 기호로 점철해놓은 이른바 한글 만능론자식의 외래어 표기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반면 예컨대 찌아찌아어의 한글 표기와 같이 본디 한글을 한국어로부터 타자화시켜야 마땅할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우행은 학자로서 지탄을 사기에 충분하다.
거란어의 경우
내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거란어를 위한 한글 표기안은 비공식적으로도 제안된 적이 없다. 거란어를 다루다보면 비교적 유명한 베트남어 [ɲɨ](調値 추상) 문제처럼 한글 표기의 관점에서 때로는 타협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예컨대 𘬜𘭪𘲚𘱪 yeruuld “耶律” 씨 이전에 거란을 통치했던 𘬜𘰜𘮀 yöḥöl “遙輦” 씨를 한글로 표기한다고 할 때, yöḥöl [jœʕœl]의 한글 표기를 정함에 있어 누구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초두 자음의 존재보다 그 모음의 素性을 중시한다면 ‹외욀›, 혹은 그 장모음적 음성 특징까지 반영한다면 ‹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음의 소성보다 초두 자음의 존재를 중시한다면 ‹요욀› 정도가 최선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로서 내 감각과 직관을 발휘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로 애매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참고로 나는 후자를 선호한다.
오타케 마사미가 「遼寧清河門西山遼墓出土漢文・契丹文墓誌訳注」(2024)에서 묵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란어 고유명의 가타카나 표기는 학술 목적으로 고안된 탓인지 지나치게 변별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범용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スィ si 나 ソゥー sʊʊ와 같은 가타카나 표기는, 흡사 마찬가지로 가나 문자를 사용해 남류큐 제어를 학술적으로 음운 전사하려고 시도한 기교에 가까운 百家百樣의 표기안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안은 학술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범용성은 낮으며, 이 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표기안은 무리한 변별은 지양할 것이다.
사실 외래어 표기법 분야의 覇者는 끝소리인데, 나는 그러한 박학한 지식을 쌓지 못했다. 그럼에도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제시된 표기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범용적으로 쓸 만한 거란어의 한글 표기안을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란어의 한글 표기안
여기서 제안하는 거란어의 한글 표기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재구음은 기본적으로 오타케 마사미의 논문 「契丹語の音調」(2024)의 각주 8번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 일부 자의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1. 모음
遼代 거란어는 단모음과 장모음을 가진다. 단모음에 대하여 ə [ɨ] ‹으› (누군가의 지적을 받아들여, 대응되는 장모음의 경우와 더불어 ‹어›로 통일할지 고민하고 있다), a [ɑ] ‹아›, u ‹우›, o [ɔ] ‹오›, i ‹이›, e [ɛ] ‹에›, ü [y] ‹위›, ö [œ] ‹외›와 같이 한글 자모를 배당한다. 단, ə [ɨ]는 전설 자음 č, š, ǰ, ž, y, ň, ľ에 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로 옮긴다.
장모음에 대하여 əə [əː] ‹어›, aa [ɑː] ‹아›, ɵɵ [oː] ‹오›, oo [ɔː] ‹오›, uu ‹우›, ʊʊ ‹우›, ii ‹이›, ee ‹에›, ää [ɛː] ‹에›, öö [œː] ‹외›, üü [yː] ‹위›와 같이 한글 자모를 배당한다.
𘱛 𘮉 ää dəw ‹에 드우› “형제”
𘲮𘳕 ǰuun ‹준› “여름”
단, 장단을 막론하고 전설 모음이 반모음에 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설성을 추상하여 한글로 옮긴다.
𘬜𘰜𘮀𘲫 yöḥölər ‹요욀르르› “遙輦”
국내에서는 어째서인지 몽골어의 u [ʊ]에 한글 ‹오›를 대응시키는 표기가 일반화된 듯한데, 《외래어 표기법》 제2장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명시되지는 않으나 영어 및 중국어 표기법의 사례를 근거로 IPA [ʊ]에는 ‹우›를 배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따른다.
2. 자음
거란어의 저해음은 강저해음과 약저해음으로 나뉜다. 강저해음은 어두 환경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 이항 대립 저해음의 음성적 특징에 대해서는 제설이 분분하나, 한글에 마련된 격음과 평음 자모를 각각 배당하기로 한다.
강저해음에 대하여 p [pʰ] ‹ㅍ›, t [tʰ] ‹ㅌ›, s [sʰ] ‹ㅅ›, č [tɕʰ] ‹ㅊ/치›, š [ɕʰ] ‹시›, k [kʰ] ‹ㅋ›, χ [χʰ] ‹ㅎ›, χʷ [χʷʰ] ‹호/후› (어말에서는 ‹ㅎ›)와 같이 한글 자모를 배당한다.
𘰷𘰂 sab ‹삽› “꿈”
𘯃𘰫 tadʊʊ ‹타두› “명銘”
약저해음에 대하여 b [p] ‹ㅂ›, d [t] ‹ㄷ› (어말에서는 ‹ㅅ›), z [s] ‹ㅅ›, ǰ [tɕ] ‹ㅈ/지›, ž [ɕ] ‹시›, g [k] ‹ㄱ›, gʷ [kʷ] ‹고/구›, γ [χ] ‹ㄱ›, γʷ [χʷ] ‹고/구› (어말에서는 ‹ㄱ›)와 같이 한글 자모를 배당한다.
𘭖𘱚 bidəg ‹비득› “문자”
𘲽𘭪𘲲𘭦 ǰeraγaǰ ‹제라가지› “짧게”
접근음에 대하여 w ‹오/우›, r ‹ㄹ›, y [j] ‹이›, h [ʔ] ‹ㅇ›, hʷ [ʔʷ] ‹오/우›, ḥ [ʕ] ‹ㅇ›, ḥʷ [ʕʷ] ‹오/우›와 같이 한글 자모를 배당한다.
𘬜𘭪𘲚𘱪 yeruuld ‹예룰드› “耶律”
𘰕𘭲𘮒 ňuḥur ‹뉴우르› “部”
비음에 대하여 m ‹ㅁ›, n ‹ㄴ›, ň [nʲ] ‹니› (어말에서는 ‹ㄴ›)의 한글 자모를 배당한다. 이때 n는 저해음 앞에서는 동기관적 비음을 나타내며 동화되며, 조건에 따라 ‹ㅁ› ‹ㅇ›으로 적절하게 옮긴다.
𘬝𘱦 mөөr ‹모르› “길”
𘰭𘱀 nəm ‹늠› “가까이”
설측음에 대하여 l ‹(ㄹ)ㄹ›, ľ [ɬʲ] ‹(ㄹ)리› (어말에서는 ‹ㄹ›)의 한글 자모를 배당한다.
𘱄𘱑𘲲𘯺 lemγaa ‹렘가› “林牙”
𘬥𘯺𘭗 šaaľ ‹샬› “郞君”
3. 표기례
씨족명
남성 단수형을 기준으로 대표 표기만을 제시한다.
𘬜𘭪𘲚𘱪 yeruuld ‹예룰드› “耶律”
𘬜𘰜𘮀𘲫 yöḥölər ‹요욀르르› “遙輦”
𘮽𘭪𘲫 berər ‹베르르› “拔里”
𘬪𘱚𘲫 ižgər ‹이시그르› “乙室己”
𘮦𘲲𘲑 deraγar ‹데라가르› “迭剌”
𘭕𘯟𘰕𘲫 əwgʊňər ‹으우구녀르› “甌昆”
𘭲𘱆𘲫 ʊḥʊyər ‹우우여르› “烏隗”
관직명
오타케 마사미(2016) 「契丹小字文献における「世選之家」 5쪽에 나오는 거란과 고대 튀르크의 관호 대응표에서 대표 표기만을 발췌하여 제시한다.
𘭅 χaa ‹하› “군주”
𘬮𘱲𘬚 tihin ‹티인› “惕隱”
𘰣𘱚𘲦 irgən ‹이르근› “夷离菫”
𘰷𘯢𘳕 senγun ‹셍군› “詳穩”
𘱄𘱑𘲲𘯺 lemγaa ‹렘가› “林牙”
𘲆𘱮 uhʷəə ‹우워› “于越”
𘭔𘱚𘰭 tərgəən ‹트르건› “忒里蹇”
孔𘰣𘰹 boyrʊγʷ ‹보이룩› “재상”
민족명
남성 단수형을 기준으로 대표 표기만을 제시한다.
𘬕𘰹𘮒 ǰawγʊr ‹자우구르› “漢”
𘬥𘲀𘭲𘮒 šʊlʊḥʊr ‹슐루우르› “고려”
𘲜𘰣𘱚𘲫 mirgər ‹미르그르› “발해”
𘰴𘬠𘯺𘲑 dedaar ‹데다르› “奚”
𘲮𘯤𘱮 ǰuurǰəə ‹주르저› “여진”
𘰺𘰆𘰥 tanγud ‹탕굿› “党項”
'언어 > 선비·몽골어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란문자 위조 골동품 (3) | 2025.03.10 |
|---|---|
| 몽골어 할하 방언의 한글 표기에 관한 문제 (0) | 2025.01.13 |
| 거란소자 자소 번호 317번의 음가 추정 (0) | 2024.12.23 |
| 거란대자 자소의 표음 유형에 따른 분류 (0) | 2024.12.10 |
| 거란문자 자료에 나오는 고려 (9) | 2024.06.08 |